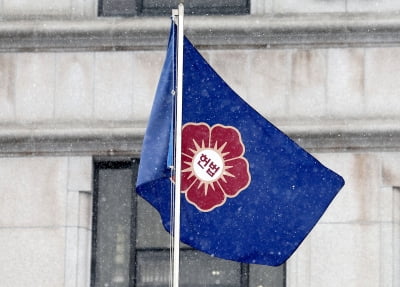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세대갈등' 부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개 공기업 신규 채용 급감…청년실업 가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년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만 59세로 1년 연장했다. 고용 안정과 인건비 절감이 목적이었다. 퇴직이 임박했던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해소됐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2년간 캠코는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기업 인력 감축 계획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한 마당에 신규 채용에 나설 엄두가 안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캠코만이 아니다. 최근 4~5년 사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잇따라 도입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빚어졌다.
정부가 중 · 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이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과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덕분에 중 · 고령자 고용은 상대적으로 나아지지만 실업난이 가장 심한 청년층의 고용은 악화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전체 공기업 297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7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채용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신입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작된 2004년 1731명에서 2005년 1383명,2006년 1056명으로 줄어들다가 2007년 1155명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2008년에는 446명으로 격감했다. 2004년 이후 5년간 신입사원 채용인원 감소율은 74.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인원이 1만2436명(2004년)에서 1만806명(2008년)으로 13.1% 줄어든 데 비하면 감소폭이 5배를 넘는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정년 보장,고용 연장(은퇴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같이 시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용 대책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 2006년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책임급 이상의 경우 만 57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면서 만 60세 정년 후 계약직으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07년부터 3년간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그러자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이를 임시 보충하기 위해 작년에는 인턴 1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8년 1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후 2년간 신규 채용인원이 5명에 그쳤다. 그나마 올 들어 20명의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채용이 조금 늘었다. 작년까지 2년간 신규 채용이 없었던 캠코도 지난해 60명이 명예퇴직하면서 빈 자리를 채울 여력이 생겨 올초 50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고령자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과 업종이 달라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많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평균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대갈등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수석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도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총 인건비의 합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93.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