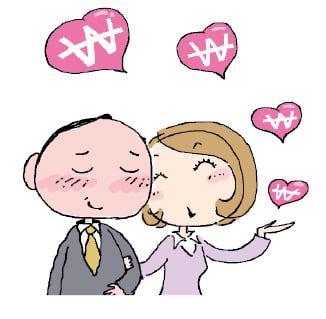'뭉칫돈' 투자받은 사교육업체들 '속앓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2 메가스터디' 꿈 꾸며
돈 끌어 모았지만 상장은 커녕 실적도 부진
돈 끌어 모았지만 상장은 커녕 실적도 부진
수도권의 한 특목고 입시 관련 업체는 2007년 해외 펀드로부터 수백억원대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호황이던 증시에 상장하면 '제2의 메가스터디'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2008년 가을 닥쳐온 금융위기 여파로 상장은 한없이 미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고강도 사교육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특목고 입시가 크게 바뀌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줄었고,학원비 단속이 심해 수익도 떨어졌다. 투자자에게 제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 업체는 지분율을 높여주기로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달래고 있다.
1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외부에서 '뭉칫돈 투자'를 받았던 상당수 교육업체들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끙끙 앓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존 대표와 투자자 측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거나 소송전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교육업체들은 한동안 'IT벤처붐'에 버금갈 정도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누렸다. '교육버블'이라는 표현마저 나올 정도였다. 인터넷 강의 사업모델을 구축해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른 메가스터디라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영향이 컸다. 특히 2007년 AIG인베스트먼트가 영어교육업체 아발론교육에 600억원,미국 칼라일펀드가 특목고 입시 전문업체 토피아아카데미에 2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8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외자 유치 소식도 잇달았다. 국내 연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티스톤도 서울 · 부산 · 경남지역 16개 학원 연합체인 타임교육홀딩스에 600억원을 투자했다.
금융위기가 닥쳐오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단 상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뭉칫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장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 때문에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중 상장하려던 업체들은 계획을 2년가량 미루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사교육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특히 외국어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나 영어 듣기평가 등 사교육 수요를 불러왔던 항목이 전부 사라지고 영어 내신과 면접 등으로 대체되면서 학원 수요가 줄었다. 학원비 단속이 심해 그간 교재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으로 올려받던 영업관행도 사라졌다. 한 학원 관계자는 "당초 투자를 받을 때는 학생 1인당 35만원가량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1인당 30만원을 밑돈다"며 "'학파라치' 등이 무서워 학원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영업시간 단속으로 편법운영도 어려워져 퇴로가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장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독촉이 시작됐다. 단기에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들은 학원업체들에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가 늦춰진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당장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학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은 지분율 조정"이라며 "상장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조금씩 떼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투자이익금 환수가 늦어질 때 학원 측이 어떻게 보상해 줄지를 담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귀띔했다.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교육업체들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청담러닝 정상JLS 등 비교적 상황이 좋은 업체들도 있지만,실적이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각종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에서 중 · 고교생 대상 입시업체를 운영해 온 젠아이학원은 작년 2월 관리종목이던 자동차부품업체 씨엔씨테크를 통해 우회상장하고 이름을 '에듀언스'로 바꿨다. 이후 실적이 나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후 유상증자로 급한 불은 껐지만,아직도 관련 소송 등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벤처투자업체 관계자는 "교육이 돈이 된다며 움직였던 우회상장업체 측과 이들을 인수했던 교육업체 측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외부에서 '뭉칫돈 투자'를 받았던 상당수 교육업체들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끙끙 앓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존 대표와 투자자 측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거나 소송전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교육업체들은 한동안 'IT벤처붐'에 버금갈 정도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누렸다. '교육버블'이라는 표현마저 나올 정도였다. 인터넷 강의 사업모델을 구축해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른 메가스터디라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영향이 컸다. 특히 2007년 AIG인베스트먼트가 영어교육업체 아발론교육에 600억원,미국 칼라일펀드가 특목고 입시 전문업체 토피아아카데미에 2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8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외자 유치 소식도 잇달았다. 국내 연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티스톤도 서울 · 부산 · 경남지역 16개 학원 연합체인 타임교육홀딩스에 600억원을 투자했다.
금융위기가 닥쳐오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단 상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뭉칫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장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 때문에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중 상장하려던 업체들은 계획을 2년가량 미루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사교육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특히 외국어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나 영어 듣기평가 등 사교육 수요를 불러왔던 항목이 전부 사라지고 영어 내신과 면접 등으로 대체되면서 학원 수요가 줄었다. 학원비 단속이 심해 그간 교재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으로 올려받던 영업관행도 사라졌다. 한 학원 관계자는 "당초 투자를 받을 때는 학생 1인당 35만원가량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1인당 30만원을 밑돈다"며 "'학파라치' 등이 무서워 학원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영업시간 단속으로 편법운영도 어려워져 퇴로가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장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독촉이 시작됐다. 단기에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들은 학원업체들에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가 늦춰진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당장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학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은 지분율 조정"이라며 "상장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조금씩 떼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투자이익금 환수가 늦어질 때 학원 측이 어떻게 보상해 줄지를 담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귀띔했다.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교육업체들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청담러닝 정상JLS 등 비교적 상황이 좋은 업체들도 있지만,실적이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각종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에서 중 · 고교생 대상 입시업체를 운영해 온 젠아이학원은 작년 2월 관리종목이던 자동차부품업체 씨엔씨테크를 통해 우회상장하고 이름을 '에듀언스'로 바꿨다. 이후 실적이 나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후 유상증자로 급한 불은 껐지만,아직도 관련 소송 등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벤처투자업체 관계자는 "교육이 돈이 된다며 움직였던 우회상장업체 측과 이들을 인수했던 교육업체 측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포토] “얼음 낚시 즐기자”…화천 산천어축제 구름 인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1761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