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012부대 vs 정류장법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과장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틴 이유는 뭘까. 우선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삭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린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전처럼 대기업 출신이라고 받아 줄 곳도 마땅히 없다. 새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지금껏 받아왔던 연봉 6000만원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절반도 받아내기 쉽지 않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녀들 혼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업자인 아빠 vs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누가 더 떳떳한 혼주일까. 게임이론으로 풀어봐도 직장에 남는 게 백번,천번 절대 우위전략이다.
모 자동차판매회사에는 '012부대'란 게 있다. 특수부대 출신모임이 아니다. 1년에 차 판매량이 한 대도 없거나 1~2대만 파는 영업사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래도 이들은 다른 사원 연봉의 70%를 기본급으로 받는다. 그렇다고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할 수도 없다. 법적인 문제에다 노조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기업들마다 출구전략을 짜느라 애를 먹고 있다. 인력은 남아도는데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문제'니,'청년층 실업해소'니 하면서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모두가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를 부추기는 '입구전략' 일색이다. 출구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같은 대기업에선 출구전략에 어려움이 없었다. '메기론'을 인사관리시스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삼성에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건 곧 '죽음'(자진 퇴사)을 뜻한다. 성과가 나쁜 C 플레이어들은 스스로 퇴사할 시기를 가늠했다. 실제로 삼성엔 '버스정류장 법칙'이란 게 있었다. 버스가 서울역을 출발(입사)해 의정부(정년퇴직)까지 간다고 치자.모든 승객이 의정부까지 가고 싶지만 저성과를 낸 승객(직원)들은 중간에 내릴 정류장(중도퇴직)을 미리 알고 하차한다는 법칙이다. 그래야 새로운 승객(입사자)들로 교체돼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사관리자)는 승객이 어디서 내릴지 미리 시그널을 주게 된다. 종로에서 내릴지,미아리,수유리에서 하차할지를.즉 입사 후 3~4년차 또는 10년차에 퇴직할지를 알려주면 그 시점에 맞춰 퇴직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출구전략이 작동되어온 셈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보이는 손'에 의한 출구전략이 필요해졌다. 퇴직을 시키려면 몇 개월치 퇴직위로수당은 기본이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처럼 강제 하차시키는 기업은 거의 없다. 잭 웰치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선 상위 20%,중위 70%,하위 10%로 나누었고 이 중 하위 10%는 매년 가차없이 퇴출시켜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든다. 고용창출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처럼 손님을 갈아태우는 출구전략도 필요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축함 만들겠다"…美 급한 불 떨어지자 벌어진 깜짝 결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5604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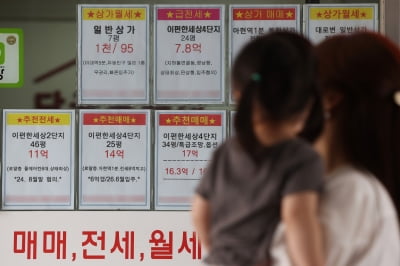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