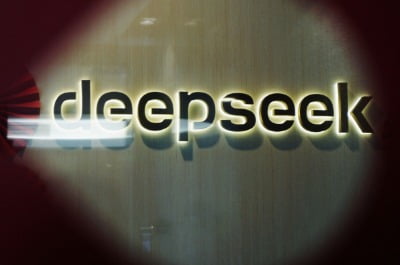[한경데스크] 대학, 기업식 개혁이 해법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토요일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학의 A총장을 등산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비교수 출신인 A총장은 요즘 학교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적지 않은 교수들의 '사적인 적'이 돼 있다. 동반 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인 '기업식 개혁'에 모아졌다. 쉬엄쉬엄 가는 길이어서 대화도 길어졌다.
A총장의 첫 마디는 "대학 개혁,정말 어렵다"였다. 개혁하기 어려운 곳이 군(軍)이라지만 대학은 군보다 두 배는 더 어려운 곳 같다고 했다. 학과 통폐합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수강생이 많지 않아 없애도 될 만한 과목이 교수 일자리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했다. 대학들이 문어발식으로 학과를 늘려 캠퍼스에 건물만 잔뜩 들어섰다는 지적이었다.
목 뒤로 흐르는 땀을 닦은 그는 교수들의 관료적 태도에 두 손,두 발을 다 들었다며 일화를 들려줬다.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한 교수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강의를 줄여달라는 요구부터 하더라는 것."편하게 학교생활하겠다는 거지요. " 강의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교수들이 더 하더라는 꾸지람도 빼놓지 않았다.
교수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이르자 그는 잠시 쉬어 가자며 한쪽 바위에 걸터 앉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백화점식 학과제를 없애더라도 남아도는 교수를 자르거나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수단은 대학에 없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대학의 경우 법학교수가 공급과잉이지만 정년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하는 게 캠퍼스의 현실.정년퇴직까지 기다리는 자연감소가 거의 유일한 구조조정 방안이라는얘기였다. 공무원 사회 못지않은 철밥통이 대학이라는 설명에 다름 아니었다.
한참 동안 대학을 비판하던 그는 "그래도 요즘 기업식 개혁에 나서는 대학이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A총장은 기업식 개혁의 성공사례로 성균관대를 들었다. 성균관대는 1996년 삼성에 인수된 이후 당시 교수 사회에 생소한 기업식 등급 평가제와 연구성과별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했다. 경쟁체제가 도입된 후 성대의 SCI(다른 전문가가 해당 논문을 인용해가는 정도)게재 논문 편수가 1996년 92편에서 2008년 2065편으로 22배 이상 급증했고,수능시험 전국 1% 이내 신입생이 43명에서 2009년 40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에게 최근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의 공통점을 물었다. 기다릴 틈도 없이 그는 "기업재단이거나 기업인 혹은 비교육계 총장이 있는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개혁안을 발표한 중앙대(두산),건국대(오명 총장),아주대(박종구 총장대행),동국대(오영교 총장)가 모두 그랬다.
"인문학이 중시되는 시대에 대학을 효율과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처럼 개혁하는 게 옳은가"라는 반문에 그는 "100여년간 변하지 않은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대학으로 만들려면 검증된 기업식 개혁이 정답일 것"이라며 "대학도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예외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대학이 성역으로 머물면 퇴보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기업식 개혁 툴(tool)을 도입하면 진보할 것"이라고 말을 맺고 하산길에 들어섰다. 그의 말에 80% 이상 공감이 간 의미 있는 주말산행이었다.
고기완 사회부장 dadad@hankyung.com
A총장의 첫 마디는 "대학 개혁,정말 어렵다"였다. 개혁하기 어려운 곳이 군(軍)이라지만 대학은 군보다 두 배는 더 어려운 곳 같다고 했다. 학과 통폐합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수강생이 많지 않아 없애도 될 만한 과목이 교수 일자리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했다. 대학들이 문어발식으로 학과를 늘려 캠퍼스에 건물만 잔뜩 들어섰다는 지적이었다.
목 뒤로 흐르는 땀을 닦은 그는 교수들의 관료적 태도에 두 손,두 발을 다 들었다며 일화를 들려줬다.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한 교수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강의를 줄여달라는 요구부터 하더라는 것."편하게 학교생활하겠다는 거지요. " 강의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교수들이 더 하더라는 꾸지람도 빼놓지 않았다.
교수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이르자 그는 잠시 쉬어 가자며 한쪽 바위에 걸터 앉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백화점식 학과제를 없애더라도 남아도는 교수를 자르거나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수단은 대학에 없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대학의 경우 법학교수가 공급과잉이지만 정년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하는 게 캠퍼스의 현실.정년퇴직까지 기다리는 자연감소가 거의 유일한 구조조정 방안이라는얘기였다. 공무원 사회 못지않은 철밥통이 대학이라는 설명에 다름 아니었다.
한참 동안 대학을 비판하던 그는 "그래도 요즘 기업식 개혁에 나서는 대학이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A총장은 기업식 개혁의 성공사례로 성균관대를 들었다. 성균관대는 1996년 삼성에 인수된 이후 당시 교수 사회에 생소한 기업식 등급 평가제와 연구성과별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했다. 경쟁체제가 도입된 후 성대의 SCI(다른 전문가가 해당 논문을 인용해가는 정도)게재 논문 편수가 1996년 92편에서 2008년 2065편으로 22배 이상 급증했고,수능시험 전국 1% 이내 신입생이 43명에서 2009년 40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에게 최근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의 공통점을 물었다. 기다릴 틈도 없이 그는 "기업재단이거나 기업인 혹은 비교육계 총장이 있는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개혁안을 발표한 중앙대(두산),건국대(오명 총장),아주대(박종구 총장대행),동국대(오영교 총장)가 모두 그랬다.
"인문학이 중시되는 시대에 대학을 효율과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처럼 개혁하는 게 옳은가"라는 반문에 그는 "100여년간 변하지 않은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대학으로 만들려면 검증된 기업식 개혁이 정답일 것"이라며 "대학도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예외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대학이 성역으로 머물면 퇴보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기업식 개혁 툴(tool)을 도입하면 진보할 것"이라고 말을 맺고 하산길에 들어섰다. 그의 말에 80% 이상 공감이 간 의미 있는 주말산행이었다.
고기완 사회부장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