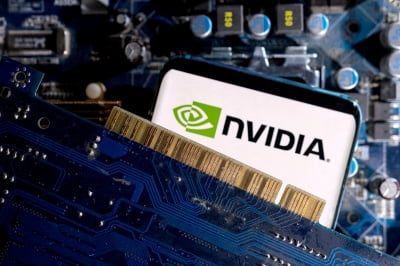키코기업, 환율하락에 파생거래 이익 많다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이익공시 8건…손실은 2건 그쳐
회계상 손실감소가 대부분
회계상 손실감소가 대부분
올 들어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화 파생상품 거래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부분 키코(KIKO) 관련 기업으로,실제로는 회계상으로만 손실이 줄어드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파생상품 거래이익 발생'을 공시한 건수는 8건으로 손실 발생공시(2건)보다 훨씬 많았다. 환율 상승기였던 2008년 손실 공시가 179건(이익 공시는 1건)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파생상품 거래 이익 공시가 늘어난 것은 환율 하락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 · 달러 환율(분기말 기준)이 가장 높았던 작년 1분기(환율 1377원) 손실 공시가 133건으로 이익 공시(1건)를 압도했지만 작년 2~4분기(1287원)엔 이익 공시가 14건으로 손실 공시(4건)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익 발생공시의 대부분이 은행과의 불평등 계약 여부로 논란을 빚은 키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코스닥 상장사인 성진바이오텍 관계자는 "공시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키코와 관련해 은행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이 환율 변동폭을 정해 그 안에선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환율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그 차액만큼 기업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2008년 초 원 · 달러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계약한 회사들일 것"이라며 "당시 계약 상한선인 1000~105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매달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들이 파생상품 거래 이익이 난 것으로 공시하는 것은 회계처리 규정 탓이다. 코스닥기업 제이브이엠의 IR담당자는 "파생상품 거래로 이익이 났다는 것은,그 이익폭만큼 계약 만료시점인 올해 말까지 키코 예상 손실액이 줄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율이 뛴 작년 1분기에 장래 발생할 손실까지 반영해 평가손실을 잡았는데 이후 환율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줄어 매분기 이익으로 잡히게 된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 이익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장부상 이익'도 주가에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송종호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키코 계약을 한 기업들의 주가가 30~50% 수준까지 폭락했던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며 "그만큼 환율에 따른 리스크가 줄고 손실액도 감소해 기업가치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파생상품 거래이익 발생'을 공시한 건수는 8건으로 손실 발생공시(2건)보다 훨씬 많았다. 환율 상승기였던 2008년 손실 공시가 179건(이익 공시는 1건)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파생상품 거래 이익 공시가 늘어난 것은 환율 하락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 · 달러 환율(분기말 기준)이 가장 높았던 작년 1분기(환율 1377원) 손실 공시가 133건으로 이익 공시(1건)를 압도했지만 작년 2~4분기(1287원)엔 이익 공시가 14건으로 손실 공시(4건)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익 발생공시의 대부분이 은행과의 불평등 계약 여부로 논란을 빚은 키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코스닥 상장사인 성진바이오텍 관계자는 "공시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키코와 관련해 은행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이 환율 변동폭을 정해 그 안에선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환율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그 차액만큼 기업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2008년 초 원 · 달러 환율 950원을 기준으로 계약한 회사들일 것"이라며 "당시 계약 상한선인 1000~105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매달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들이 파생상품 거래 이익이 난 것으로 공시하는 것은 회계처리 규정 탓이다. 코스닥기업 제이브이엠의 IR담당자는 "파생상품 거래로 이익이 났다는 것은,그 이익폭만큼 계약 만료시점인 올해 말까지 키코 예상 손실액이 줄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율이 뛴 작년 1분기에 장래 발생할 손실까지 반영해 평가손실을 잡았는데 이후 환율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줄어 매분기 이익으로 잡히게 된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 이익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장부상 이익'도 주가에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송종호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키코 계약을 한 기업들의 주가가 30~50% 수준까지 폭락했던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며 "그만큼 환율에 따른 리스크가 줄고 손실액도 감소해 기업가치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