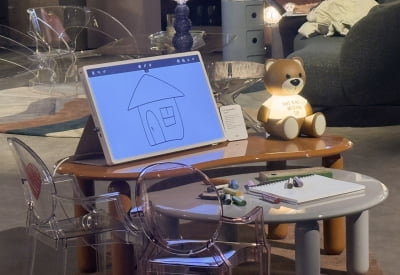하지만 각국의 고용률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의 지난달 고용률은 58.8%(계절조정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2009년 65.0%)에 비해 6.5%포인트나 낮았다. 한국의 고용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비밀은 비(非)경제활동인구에 있다. 지난달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63만2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38.6%를 차지했다. 이는 30% 안팎에 그친 OECD 회원국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남북 군사대치로 군인 숫자가 많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졸업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게 된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실업자들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구직단념자가 되면 실업자 수가 그만큼 줄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 구직자들이 늘어나게 되고,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에 비해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15세 이상 모든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단념이나 취학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월 기준 4048만9000명으로 고용률을 1%포인트 높이려면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늘어나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MS 불안에도 메타·테슬라 강세…오전엔 한파 오후엔 눈·비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5704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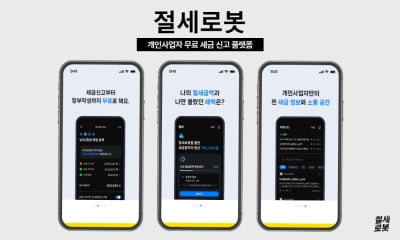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0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