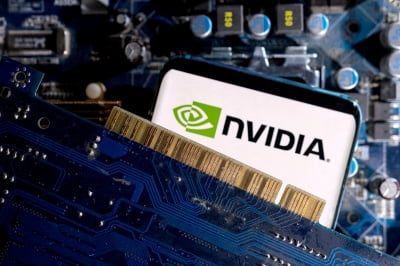잘나가던 아구스 퇴출과정 보니‥허술한 배임·횡령 공시…투자자들 '날벼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 발표·검찰 기소후에야 공시
횡령 뚜렷해도 투자자 알 길없어
공시후엔 거래정지→퇴출 이어져
사전경고 장치마련 시급
횡령 뚜렷해도 투자자 알 길없어
공시후엔 거래정지→퇴출 이어져
사전경고 장치마련 시급
건전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분기보고서나 각종 공시에서도 부실 징후를 찾기 힘든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임직원의 횡령 · 배임이 드러나는 경우다. 횡령 사실이 공표되는 시점에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횡령액이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감독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일이 적지 않다.
◆회사가 횡령 공시 늦추면 속수무책
지난 3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아구스가 단적인 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분기 영업이익을 냈고 현금성 자산만 89억원을 보유했던 우량회사였다.
문제는 작년 말 전 대표이사 천모씨가 161억원을 횡령하면서 시작됐다. 횡령 사실을 발견한 담당 회계법인이 올 1월 말부터 4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 천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지만,아구스 경영진은 회계법인이 이를 문제삼아 3월19일 감사의견 거절을 낸 뒤에야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천씨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주식 매매가 정지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구스 투자자들은 결국 주당 2000원 안팎에 산 주식을 35원에 정리매매 해야 했다.
담당 회계법인을 비롯해 회사 안팎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횡령 징후가 감지됐지만 투자자들은 알 길이 없었다. 거래소가 횡령 발생의 공시 시점을 '회사가 횡령 발생 사실을 인정한 때'와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횡령 발생 공포를 의도적으로 미루더라도 투자자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말까지 아구스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횡령이 대표와 핵심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알 수 없었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숨겨 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공시요건 까다로워 피해자 양산
횡령 공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참 지나서야 공시가 나오는 사례까지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씨디는 지난달 7일 박모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횡령 발생을 공시한 것은 23일로 보름 이상 지난 뒤였다.
그제서야 에스씨디 주식은 매매정지됐지만 그 사이 12거래일 동안 3754만주나 거래됐다. 횡령 사실이 보도되며 폭락한 주식이 작전세력에 이용되는 한편,이를 모르고 주식을 산 투자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발 시점이 아니라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횡령 발생 공시를 함에 따라 생긴 일"이라며 "공시는 기소 중심주의를 철저히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이처럼 횡령과 관련한 공시 · 감독 제도 미비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에스씨디의 한 소액주주는 "한번 발생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 · 배임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담당 회계법인이 수시로 관련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하는 등 감독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 공시를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이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회사나 경영진이 배상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회사가 횡령 공시 늦추면 속수무책
지난 3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아구스가 단적인 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분기 영업이익을 냈고 현금성 자산만 89억원을 보유했던 우량회사였다.
문제는 작년 말 전 대표이사 천모씨가 161억원을 횡령하면서 시작됐다. 횡령 사실을 발견한 담당 회계법인이 올 1월 말부터 4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 천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지만,아구스 경영진은 회계법인이 이를 문제삼아 3월19일 감사의견 거절을 낸 뒤에야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천씨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주식 매매가 정지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구스 투자자들은 결국 주당 2000원 안팎에 산 주식을 35원에 정리매매 해야 했다.
담당 회계법인을 비롯해 회사 안팎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횡령 징후가 감지됐지만 투자자들은 알 길이 없었다. 거래소가 횡령 발생의 공시 시점을 '회사가 횡령 발생 사실을 인정한 때'와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횡령 발생 공포를 의도적으로 미루더라도 투자자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말까지 아구스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횡령이 대표와 핵심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알 수 없었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숨겨 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공시요건 까다로워 피해자 양산
횡령 공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참 지나서야 공시가 나오는 사례까지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씨디는 지난달 7일 박모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횡령 발생을 공시한 것은 23일로 보름 이상 지난 뒤였다.
그제서야 에스씨디 주식은 매매정지됐지만 그 사이 12거래일 동안 3754만주나 거래됐다. 횡령 사실이 보도되며 폭락한 주식이 작전세력에 이용되는 한편,이를 모르고 주식을 산 투자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발 시점이 아니라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횡령 발생 공시를 함에 따라 생긴 일"이라며 "공시는 기소 중심주의를 철저히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이처럼 횡령과 관련한 공시 · 감독 제도 미비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에스씨디의 한 소액주주는 "한번 발생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 · 배임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담당 회계법인이 수시로 관련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하는 등 감독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 공시를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이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회사나 경영진이 배상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