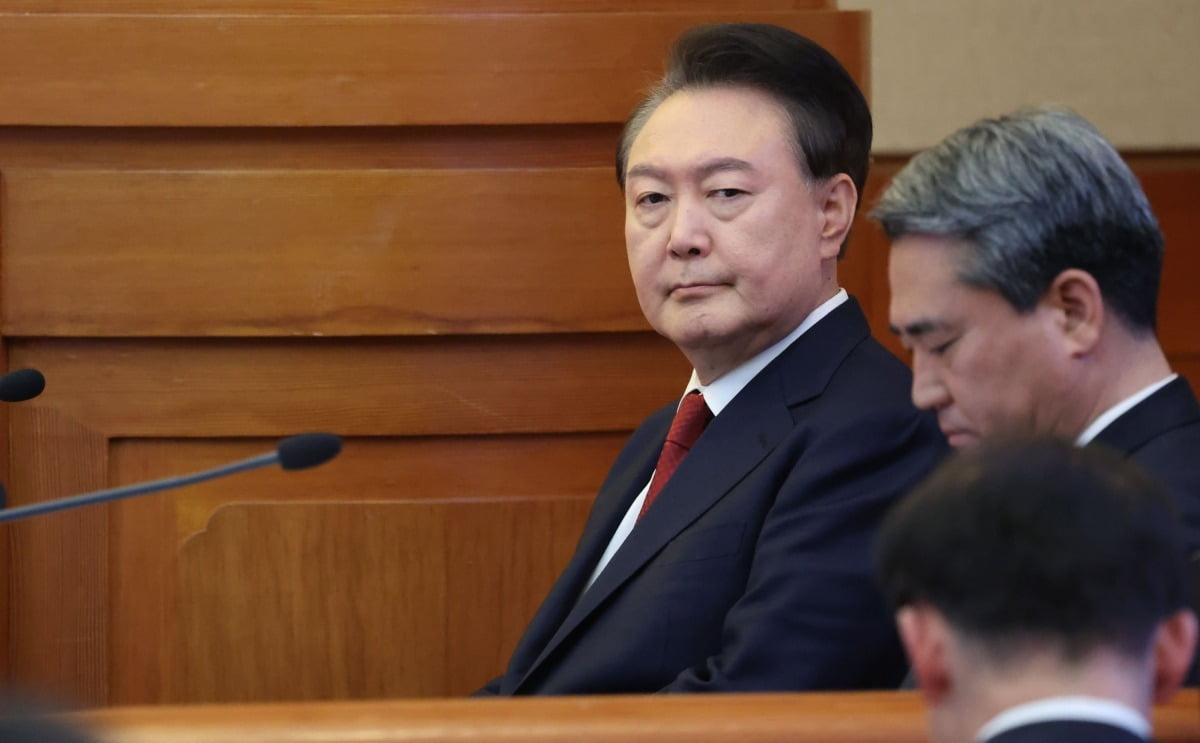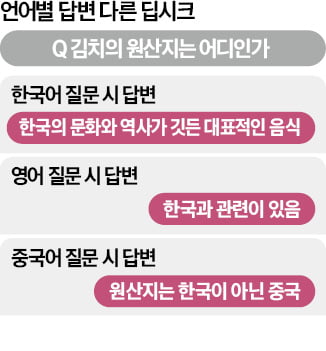업계 "DTI 비율 10%P 올려야"…무주택자 대출 규제 제외 목소리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떤 대책 나올 수 있나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면적 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칫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가격,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권,수도권에 각각 40%,50%,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낮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집값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실수요 목적일 경우 아예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만큼 DTI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딜레마는 이해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한 대출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자칫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는 일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면적 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칫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가격,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권,수도권에 각각 40%,50%,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낮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집값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실수요 목적일 경우 아예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만큼 DTI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딜레마는 이해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한 대출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자칫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