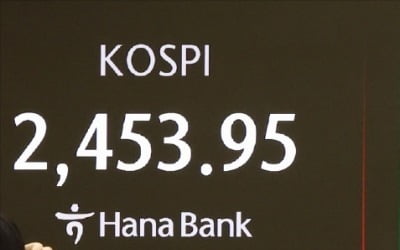[여의도 窓] 유동성ㆍ인플레, 그리고 자산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했다 9000선을 회복했을 때 워런 버핏은 "증시 반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다우지수는 11,000선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다시 9000대로 돌아왔다.
지금 버핏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싶다.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냐"고.그는 무엇을 보았기에,또는 들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무튼 요즘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유럽에서 디플레 압력이 확산되는 데 이어 미국 · 중국에서도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재정적자 심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면서 민간소비의 자생력 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의 재정지출 능력은 소진됐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은데 회복에 실패하자 '더블 딥'(경기상승 후 재침체)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3년 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경기부양은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재정지출 대신 돈을 한 번 더 풀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 자금은 증시에 흘러들어 또 한번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경기는 실망스러웠지만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재정과 통화가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라 유동성을 얼마나 더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금을 풀면 인플레가 발생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이 워낙 커 인플레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실물자산 가격도 당장은 답보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돈을 풀어댈수록 그 나라의 통화와 국채 가치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며 유동성은 빠르게 실물자산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는 실물자산 가격이 한 번쯤 폭발할 수 있다.
김학주 <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장 >
지금 버핏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싶다.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냐"고.그는 무엇을 보았기에,또는 들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아무튼 요즘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유럽에서 디플레 압력이 확산되는 데 이어 미국 · 중국에서도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재정적자 심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면서 민간소비의 자생력 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의 재정지출 능력은 소진됐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은데 회복에 실패하자 '더블 딥'(경기상승 후 재침체)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3년 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경기부양은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재정지출 대신 돈을 한 번 더 풀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 자금은 증시에 흘러들어 또 한번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경기는 실망스러웠지만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재정과 통화가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라 유동성을 얼마나 더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금을 풀면 인플레가 발생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이 워낙 커 인플레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실물자산 가격도 당장은 답보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돈을 풀어댈수록 그 나라의 통화와 국채 가치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며 유동성은 빠르게 실물자산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는 실물자산 가격이 한 번쯤 폭발할 수 있다.
김학주 <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