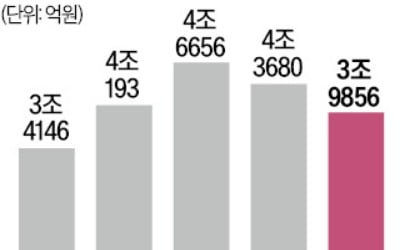[사설] '친서민'에 시장경제원칙 흔들려서는 안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정 운영의 초점이 친(親)서민에 집중되면서 주요 정책이 표류하거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일방으로 흐르고 복지의 측면에 치우칠 경우,자칫 시장논리가 무너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산된 것은 경제정책이 친서민을 내세운 정무적 판단에 밀려 정부내 조율에 실패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대책의 핵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거론됐지만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에 묻히고 말았다.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장 시급한 실수요자 대책,세제 보완 등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정부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도 그렇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 · 중소기업의 관계를 선악(善惡)의 논리로 접근,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한다는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대기업 두들기기가 되고 반(反)기업 정서만 부추겨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갈길 바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벌이 하는 캐피털(금융회사)이 이자를 일수 이자 받듯이 하면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말한 것도 우려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캐피털회사들이 연 30%대의 대출 금리를 물리는 것은 높은 조달금리,10%대의 부실률 등을 감안해도 분명히 과도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없이 금리인하만을 강요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상당수 소비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국 당장 돈이 급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친서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논리에 의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무너질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르고,이는 또다시 사회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산된 것은 경제정책이 친서민을 내세운 정무적 판단에 밀려 정부내 조율에 실패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대책의 핵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거론됐지만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에 묻히고 말았다.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장 시급한 실수요자 대책,세제 보완 등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정부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것도 그렇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 · 중소기업의 관계를 선악(善惡)의 논리로 접근,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한다는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대기업 두들기기가 되고 반(反)기업 정서만 부추겨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갈길 바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벌이 하는 캐피털(금융회사)이 이자를 일수 이자 받듯이 하면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말한 것도 우려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캐피털회사들이 연 30%대의 대출 금리를 물리는 것은 높은 조달금리,10%대의 부실률 등을 감안해도 분명히 과도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없이 금리인하만을 강요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상당수 소비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국 당장 돈이 급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친서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논리에 의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무너질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르고,이는 또다시 사회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