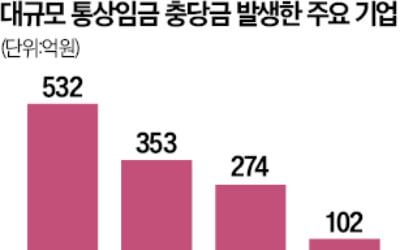[통계로 읽는 경제] 취업애로 계층 등 포함 체감 실업률은 5%대 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식 통계보다 2%P 높아…15~29세 청년층, 23% 달해
실업률은 정부 통계 가운데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다. 8월 실업률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5%)의 절반도 안 되지만 청년실업 등 현실의 체감 고용 상황은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고용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감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집계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를 참고할 만하다. BLS는 실업자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U1부터 U6까지 6가지 방법으로 실업률을 집계한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은 U6이다. U6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없으면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정의되는 일반적 의미의 실업자 외에 단시간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와 구직단념자도 실업자로 간주한다.
한국의 고용 상황을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8월 실업자는 119만2000명,실업률은 4.8%다.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자 83만1000명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13만8000명과 구직단념자 22만3000명을 더한 것이다. 정부 공식 통계에 비해 실업자는 36만1000명 많고 실업률은 1.5%포인트 높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취업애로계층도 체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육아 · 가사 등의 이유로 쉬고 있지만 구직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것으로 8월 현재 180만명 수준이다. 취업애로계층을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5%대 후반으로 3%대 초반인 공식 실업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청년층의 체감 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 15~29세 인구 중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은 23.0%로 정부가 집계한 청년층 실업률 8.6%의 3배에 이른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경기 흐름과 상관 없이 청년 고용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체감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집계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를 참고할 만하다. BLS는 실업자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U1부터 U6까지 6가지 방법으로 실업률을 집계한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은 U6이다. U6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없으면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정의되는 일반적 의미의 실업자 외에 단시간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와 구직단념자도 실업자로 간주한다.
한국의 고용 상황을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8월 실업자는 119만2000명,실업률은 4.8%다.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자 83만1000명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13만8000명과 구직단념자 22만3000명을 더한 것이다. 정부 공식 통계에 비해 실업자는 36만1000명 많고 실업률은 1.5%포인트 높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취업애로계층도 체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육아 · 가사 등의 이유로 쉬고 있지만 구직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것으로 8월 현재 180만명 수준이다. 취업애로계층을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5%대 후반으로 3%대 초반인 공식 실업률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청년층의 체감 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 15~29세 인구 중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은 23.0%로 정부가 집계한 청년층 실업률 8.6%의 3배에 이른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며 "경기 흐름과 상관 없이 청년 고용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