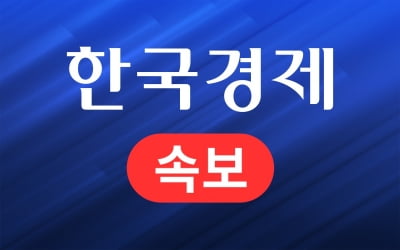[중국 고전 인물열전] (24) 이광(李廣), 흉노와 70번 싸워 모두 이겼지만 처세에 실패한 '비운의 名將'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상 이치에 너무 밝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어리석거나 순진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도 곤란하다.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봉록을 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때론 자신의 업적을 과신해 오판하거나 심지어 최고경영자(CEO)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사기》의 '이장군열전'에 보면 이런 유형의 인물인 이광,즉 이 장군 이야기가 나온다. 이광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한다. 그가 활을 잘 쏘는 것도 천부적 재능이어서 그의 자손이나 남들이 아무리 배워도 이광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고 말수가 적었으며,다른 사람과 한가하게 있을 때는 땅바닥에 진형을 그려 놓고,땅의 넓고 좁은 것을 재 표적을 만든 뒤 활을 쏘아 누가 멀고 가까운가를 비교해 내기 술을 마시곤 했다. 이처럼 활쏘기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전쟁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광은 흉노에게는 신화 같은 존재였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였던 그는 청렴해 상을 받으면 부하들에게 나눠주었고,음식도 군사들과 함께 먹을 정도로 너그러웠다. 군사를 인솔할 때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보아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아랫사람에게 잘 대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관대해 병졸들은 그의 지휘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에게는 희한한 습관이 있었다. 활을 쏠 때는 적이 습격해 와도 거리가 수십보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쏘지 않았는데,쏘기만 하면 활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고꾸라지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그는 싸움터에서 자주 적에게 포위되거나 곤욕을 당했고,맹수를 쏠 때도 부상하는 일이 많았다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다.
그가 부상하는 일이 잦은 것은 싸움 자체를 즐겼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적과 정면으로 승부하려고만 하지 때로는 꼼수를 부려 적의 뒤통수를 치는 것도 중요한 전쟁의 기술인데,그는 그런 유형의 전투 방식을 전혀 쓰지 않았다. 손자(孫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그에게는 통하지 않는 싸움의 원칙인 셈이다.
이광은 죽을 때까지 40여년에 걸쳐 봉록 2000석을 받는 관직에 있었으나 집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을 만큼 청빈한 장수였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흉노와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다 이기며 전무후무한 공을 세우고도 지위가 2000석급에 머물고 제후급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위해 싸우지 않고 스스로 전쟁 그 자체에 만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의 기술이 서툴렀던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주변을 돌아보며 상 · 하와 좌 · 우 관계에도 눈을 돌리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자신의 힘과 의지만 믿고 분위기 파악에 서투르면 자칫 희생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원중 < 건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wjkim@konyang.ac.kr >
《사기》의 '이장군열전'에 보면 이런 유형의 인물인 이광,즉 이 장군 이야기가 나온다. 이광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한다. 그가 활을 잘 쏘는 것도 천부적 재능이어서 그의 자손이나 남들이 아무리 배워도 이광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고 말수가 적었으며,다른 사람과 한가하게 있을 때는 땅바닥에 진형을 그려 놓고,땅의 넓고 좁은 것을 재 표적을 만든 뒤 활을 쏘아 누가 멀고 가까운가를 비교해 내기 술을 마시곤 했다. 이처럼 활쏘기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전쟁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광은 흉노에게는 신화 같은 존재였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였던 그는 청렴해 상을 받으면 부하들에게 나눠주었고,음식도 군사들과 함께 먹을 정도로 너그러웠다. 군사를 인솔할 때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보아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정도로 아랫사람에게 잘 대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관대해 병졸들은 그의 지휘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에게는 희한한 습관이 있었다. 활을 쏠 때는 적이 습격해 와도 거리가 수십보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쏘지 않았는데,쏘기만 하면 활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고꾸라지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그는 싸움터에서 자주 적에게 포위되거나 곤욕을 당했고,맹수를 쏠 때도 부상하는 일이 많았다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다.
그가 부상하는 일이 잦은 것은 싸움 자체를 즐겼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적과 정면으로 승부하려고만 하지 때로는 꼼수를 부려 적의 뒤통수를 치는 것도 중요한 전쟁의 기술인데,그는 그런 유형의 전투 방식을 전혀 쓰지 않았다. 손자(孫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그에게는 통하지 않는 싸움의 원칙인 셈이다.
이광은 죽을 때까지 40여년에 걸쳐 봉록 2000석을 받는 관직에 있었으나 집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을 만큼 청빈한 장수였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흉노와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다 이기며 전무후무한 공을 세우고도 지위가 2000석급에 머물고 제후급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위해 싸우지 않고 스스로 전쟁 그 자체에 만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의 기술이 서툴렀던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주변을 돌아보며 상 · 하와 좌 · 우 관계에도 눈을 돌리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자신의 힘과 의지만 믿고 분위기 파악에 서투르면 자칫 희생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원중 < 건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wjkim@ko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