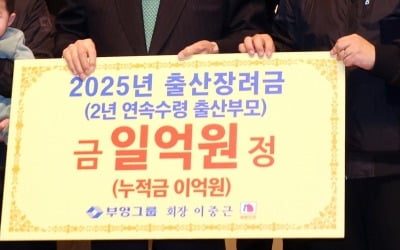[강남부자는 지금] 올 초엔 스팩·공모주에 뭉칫돈…요즘엔 동남아·남미 사모펀드 인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은 올 한 해 중국본토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17차례나 조직했다. 지난 4월부터 PB 고객들의 신청이 몰린 탓이다. 만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짧은 데다 6월 기준 수익률이 연 36%에 육박하면서 매번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자금만 50억~100억원 모였다. 사모펀드가 돈 있는 강남부자들 사이에선 그만큼 인기 있다는 사례다.
◆49명 이하로 구성된 맞춤형 펀드
한상언 신한은행 PB팀장은 "부자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특성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 큰 흐름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인기"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란 글자 그대로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대신 몇몇 고객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펀드다. 은행이 유망한 투자처나 투자 상품을 발굴해내면 입소문을 타고 투자금이 모여 거액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보통 49명 이하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수익률은 펀드마다 다르다. 50% 이상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펀드도 있다. 사모펀드 규모는 보통 1000억원 이하로 300억~500억원 규모가 가장 많다. 이정걸 국민은행 PB팀장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청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투자고객의 동의하에 계속 운영되기도 한다"며 "최근 국민은행 PB 고객들의 사모펀드 중 한 달 만에 연 15%의 수익률을 달성해 조기 청산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사모펀드의 장점은 뭘까. 이 팀장은 "공모펀드보다 만들기 쉽고, 금융당국 승인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설명서와 운용계획서에 대해 일일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허가가 쉽게 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에도 대세가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집중 투자하는 '스팩 펀드'는 올 초 유행했다. 이어 공모주 펀드,장외 주식 펀드를 비롯해 최근 자문형 랩 어카운트 펀드가 인기다.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투자자별로 싸서(wrap) 개별계좌(account)를 만든 후 투자자 의향에 맞춰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해외 투자 사모펀드 인기
최근엔 해외 주식시장과 연결된 사모펀드를 찾는 부자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해외 쪽보다는 국내 주식시장과 연결된 사모펀드를 만들어왔지만 최근 북한 변수가 발생한 이후 해외 주식시장과 연결된 사모펀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팀장도 "최근엔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았지고 있고, 특히 중국 긴축 여파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이 인기"라며 "중남미 지역의 주식도 인기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와 관련,KB자산운용의 KB아세안펀드와 산은자산운용의 '산은 짐로저스에그리인덱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상영 하나은행 PB팀장은 "공격적 성향을 가진 분은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은 이머징 국가 채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해 리버스펀드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VIX)지수와 관련된 사모펀드도 시시각각 조직돼 판매되고 있다고 한상언 팀장은 소개했다.
은행별로도 사모펀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신한은행은 원자재 주식 채권 등 분야별로 전문 개발인력을 확보해 PB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그때그때 내놓고 있다. 한 팀장은 "한발 앞선 재테크 전략을 구사하는 강남 부자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시장을 선도하는 사모펀드 개발이 중요하다"며 "은행 간에도 상품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