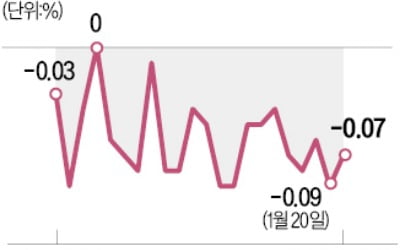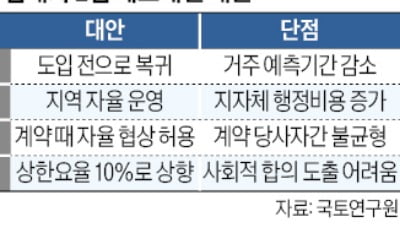[현대건설 인수전 법정싸움 격화] 본입찰 하루 뒤 우선협상자 '초고속 선정'…"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왜 이렇게 꼬였나
현대건설 인수전이 국내 인수 · 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는 입찰 참여자 간의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왜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M&A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인수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한다. 현대건설은 당초 내년 초에 M&A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채권단은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9월 매각공고를 내고 지난달 15일 본입찰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본입찰 하루 뒤인 16일 서둘러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매각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린 시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2008년 대우조선 1차 매각 당시의 10개월,올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과정에서 5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매각이 진행된 셈이다.
문제는 초고속 매각과 맞물려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 있다. 채권단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선 인수 후보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사이에 두고 근거 없는 설이 난무했다. 후보기업들의 감정싸움이 두드러지게 벌어졌지만 채권단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채권단이 매각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흙탕 싸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엔 채권단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혼선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만 해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던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자금출처가 미심쩍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면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전격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단은 펄쩍 뛰었다.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현대그룹,현대차그룹 사이의 대립이 채권단으로 확산된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끼면서 사정은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의 입김으로 현대건설 인수전을 사이에 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M&A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대우건설 사태 이후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본입찰 당시 평가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한 명쾌한 검증 없이 인수전을 지금까지 끌고 온 채권단이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M&A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인수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한다. 현대건설은 당초 내년 초에 M&A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채권단은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9월 매각공고를 내고 지난달 15일 본입찰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본입찰 하루 뒤인 16일 서둘러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매각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린 시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2008년 대우조선 1차 매각 당시의 10개월,올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과정에서 5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매각이 진행된 셈이다.
문제는 초고속 매각과 맞물려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 있다. 채권단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선 인수 후보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사이에 두고 근거 없는 설이 난무했다. 후보기업들의 감정싸움이 두드러지게 벌어졌지만 채권단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채권단이 매각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흙탕 싸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엔 채권단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혼선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만 해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던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자금출처가 미심쩍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면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전격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단은 펄쩍 뛰었다.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현대그룹,현대차그룹 사이의 대립이 채권단으로 확산된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끼면서 사정은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의 입김으로 현대건설 인수전을 사이에 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M&A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대우건설 사태 이후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본입찰 당시 평가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한 명쾌한 검증 없이 인수전을 지금까지 끌고 온 채권단이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