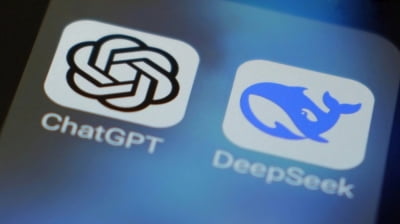작년 톱10펀드 '2년차 징크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피 상승률 겨우 웃돌아
4개는 400위권 밖으로 추락 … 작년 1위 '마이트리플'은 선전
4개는 400위권 밖으로 추락 … 작년 1위 '마이트리플'은 선전
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던 주식형펀드들이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올해는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한 해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이듬해 수익률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수익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1.27%로,코스피지수 상승률(18.02%)을 약간 웃도는 데 그쳤다. 지난해 톱10 펀드 중 올해도 10위 안에 든 펀드는 3개에 불과했고,일부 펀드는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들 펀드는 작년 평균 수익률이 99.13%로 지수 상승률(49.65%)의 두 배에 달했었다.
특정 부문이나 업종(섹터)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들이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지난해 114.77%의 수익률로 전체 669개 주식형 펀드 중 3위에 올랐던 '하나UBS IT코리아1'은 올해 정보기술(IT) 업종 부진으로 인해 2.46%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순위는 638위로 최하위권이다. 작년 4위(105.68%)였던 '미래에셋맵스IT섹터1'도 올해 2.44%에 그쳐 642위로 떨어졌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펀드가 매년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는 매우 힘들다"며 "주도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같은 운용전략이 매번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위(120.35%)였던 '마이트리플스타A'는 올해도 31.03%의 수익을 내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 '하이중소형주플러스1'(34.99%)과 10위 '알리안츠베스트중소형C/B'(36.87%)는 올해 30% 넘는 수익률을 올리며 각각 8위,5위를 기록했다.
하이중소형주플러스1 펀드를 운용하는 임은미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차장은 "중소형주 펀드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형주도 편입해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며 "펀드 설정액이 클래스를 다 합쳐 160억원이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13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수익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1.27%로,코스피지수 상승률(18.02%)을 약간 웃도는 데 그쳤다. 지난해 톱10 펀드 중 올해도 10위 안에 든 펀드는 3개에 불과했고,일부 펀드는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이들 펀드는 작년 평균 수익률이 99.13%로 지수 상승률(49.65%)의 두 배에 달했었다.
특정 부문이나 업종(섹터)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들이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지난해 114.77%의 수익률로 전체 669개 주식형 펀드 중 3위에 올랐던 '하나UBS IT코리아1'은 올해 정보기술(IT) 업종 부진으로 인해 2.46%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순위는 638위로 최하위권이다. 작년 4위(105.68%)였던 '미래에셋맵스IT섹터1'도 올해 2.44%에 그쳐 642위로 떨어졌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펀드가 매년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는 매우 힘들다"며 "주도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같은 운용전략이 매번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위(120.35%)였던 '마이트리플스타A'는 올해도 31.03%의 수익을 내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 '하이중소형주플러스1'(34.99%)과 10위 '알리안츠베스트중소형C/B'(36.87%)는 올해 30% 넘는 수익률을 올리며 각각 8위,5위를 기록했다.
하이중소형주플러스1 펀드를 운용하는 임은미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차장은 "중소형주 펀드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형주도 편입해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며 "펀드 설정액이 클래스를 다 합쳐 160억원이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