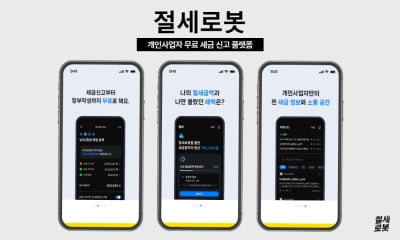[2011 대전망-물가] 유가 100弗…원자재發 인플레 오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석유ㆍ금속ㆍ곡물값 상승
수급 요인 외투기성 자금 영향
中 긴축 강화…오름세 꺾일 수도
수급 요인 외투기성 자금 영향
中 긴축 강화…오름세 꺾일 수도
석유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7~2008년의 '원자재 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회복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현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
◆뛰는 유가,내년엔 더 뛴다
지난해 12월22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5월 말 73달러 선과 비교하면 23%가량 뛰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원유 재고 부족,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늘어난 달러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쏠린 결과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기간산업실장은 "미국이 풀어 놓은 돈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요인이다.
올해 평균 유가는 작년(배럴당 78달러)보다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영국의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은 올해 평균 유가를 배럴당 82~88달러 선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도 85달러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가 100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향후 6개월 내 배럴당 100달러,1년 내 배럴당 10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 가격도 널뛰기
구리 은 알루미늄 등 금속 가격도 오름세다. 특히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구리 가격은 작년 12월21일 t당 941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은 가격도 작년 12월 초 온스당 30달러 선 벽을 깨며 연초 대비 80% 가까이 급등했다. 팔라듐은 온스당 750달러를 웃돌며 1년간 85%가량 뛰었다.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원당 가격은 지난해 12월23일 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장중 한때 파운드당 34달러 넘게 오르며 1980년 11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두 가격은 부셸당 20달러를 넘었다. 2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값 강세가 수급 요인 외에 투기성 자금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초부터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1212억달러에 이른다. 헤지펀드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이 원자재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신중론의 배경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상품 가격 오름세도 꺾일 수 있다는 논리다.
◆'원자재발(發) 인플레' 우려
원자재 가격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물가 불안이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뛰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발표한 11월 수입물가가 단적인 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은 6개월 만의 최고인 8.2%(전년 동월 대비)에 달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경상수지가 8억달러씩 줄어든다.
기업들도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구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를 제때 인상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뛰는 유가,내년엔 더 뛴다
지난해 12월22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5월 말 73달러 선과 비교하면 23%가량 뛰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원유 재고 부족,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늘어난 달러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쏠린 결과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기간산업실장은 "미국이 풀어 놓은 돈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요인이다.
올해 평균 유가는 작년(배럴당 78달러)보다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영국의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은 올해 평균 유가를 배럴당 82~88달러 선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도 85달러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가 100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향후 6개월 내 배럴당 100달러,1년 내 배럴당 10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 가격도 널뛰기
구리 은 알루미늄 등 금속 가격도 오름세다. 특히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구리 가격은 작년 12월21일 t당 941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은 가격도 작년 12월 초 온스당 30달러 선 벽을 깨며 연초 대비 80% 가까이 급등했다. 팔라듐은 온스당 750달러를 웃돌며 1년간 85%가량 뛰었다.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원당 가격은 지난해 12월23일 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장중 한때 파운드당 34달러 넘게 오르며 1980년 11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두 가격은 부셸당 20달러를 넘었다. 2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값 강세가 수급 요인 외에 투기성 자금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초부터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1212억달러에 이른다. 헤지펀드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이 원자재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신중론의 배경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상품 가격 오름세도 꺾일 수 있다는 논리다.
◆'원자재발(發) 인플레' 우려
원자재 가격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물가 불안이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뛰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발표한 11월 수입물가가 단적인 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은 6개월 만의 최고인 8.2%(전년 동월 대비)에 달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경상수지가 8억달러씩 줄어든다.
기업들도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구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를 제때 인상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