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계 '큰 별' 박완서씨 별세] 전쟁·여성 아픔 어루만진 '母性 작가'…裸木으로 돌아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품 세계와 인생 스토리
한국 현대사 온몸으로 겪으며 위선과 고통 대중적 코드로 풀어
최근엔 관조적 노년문학 관심
한국 현대사 온몸으로 겪으며 위선과 고통 대중적 코드로 풀어
최근엔 관조적 노년문학 관심
한국 문학의 어머니이자 큰 별인 소설가 박완서씨가 22일 오전 6시17분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지난해 9월 담낭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치료를 해왔으나 최근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날 세상을 떠났다.
2008년 별세한 박경리씨의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박경리씨와 함께 현대 여성 문인의 양대 축이었다. 최근까지도 펜을 놓지 않아'영원한 현역'으로 불렸다. 쉼없는 집필 활동과 강연,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단 심사위원직을 수락하면 자신의 견해를 양보하지 않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 세상을 떠난 날도 계간 '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 심사일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를 찾은 소설가 이경자씨는 "현역에서비로소 은퇴했지만,살아오신 삶의 흔적과 작품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짜 영원한 현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1931년 개성의 외곽 지역인 개풍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서울 숙명여고를 졸업한 뒤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그 해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퇴했다.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오빠가 여덟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가족이 차례로 '빨갱이'와 '반동'으로 몰리며 수난을 겪었던 전쟁의 상처는 그를 뒤늦게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동기가 됐다.
그는 생전에 "살아남기 위해 견딘 수모와 만행을 언젠가 증언하고 글로 남겨야겠다는 일념이 있었다"거나 "사람들은 또 전쟁 얘기를 우려먹냐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하다"고 말했다.
불혹을 맞은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裸木)' 당선으로 등단한 그의 작품 세계는 자신의 인생과 한국사의 변천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6 · 25전쟁과 분단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그는 개인과 사회,이데올로기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역작을 남겼다.
급격한 산업화 시기였던 1970~1980년대에는 중산층의 일그러진 도덕성과 위선을 파헤쳤으며 《서 있는 여자》 등 여성 억압에 맞서는 작품으로 우리 사회를 되비췄다.
1988년 남편과 사별하고 같은 해 서울대 의과대 레지던트 과정에 있던 외아들(호원태)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뒤에는 가톨릭에 귀의해(세례명 정혜엘리사벳) 《저문날의 삽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8년) 등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치유의 글쓰기를 이어갔다.
그는 중산층과 여성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묘사,위선과 다양한 욕망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코드로 풀어내면서 수많은 독자들을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소설가 오정희씨는 "글 속에 젊음과 만년이 두루 갖춘 문학을 추구한 점이 오랜 세월 독자들을 끌어안았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권혁웅씨는 "영원한 현역이란 정신적 의미의 생산성을 말하는 것인데 작가 스스로 최신작을 포함해 책을 많이 읽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새로워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한국 문학의 조로(早老)현상을 극복하고 대중의 삶에 기반해 꾸준히 소설을 쓴 분"이라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 25일 오전.장지는 용인 천주교공원묘지.(02)3410-6916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혈당수치 때문에 '30분씩 걷기' 했는데…연구 결과에 '당황'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177172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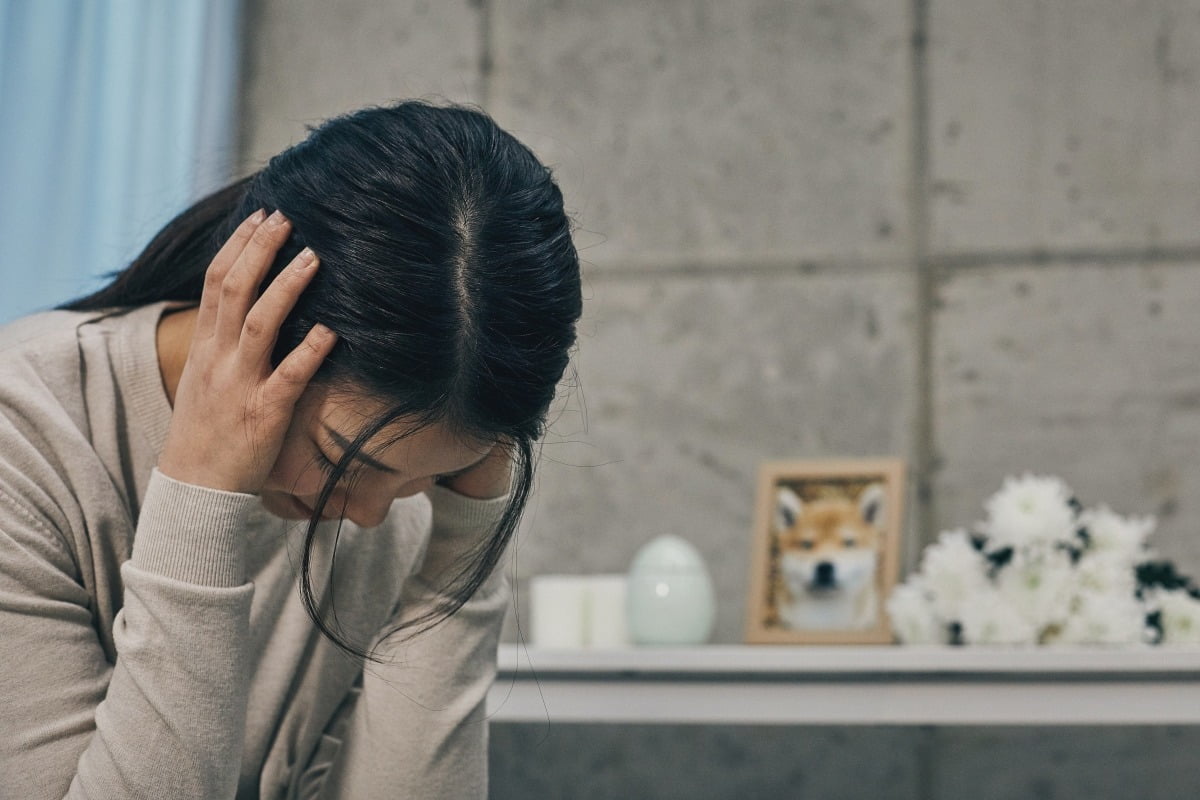
![설탕 든 탄산음료 하루 한 캔 마셨더니…끔찍한 결과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121276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