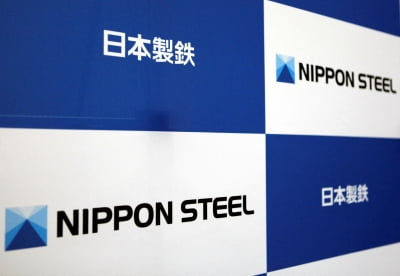[금융위기 후 국가신용 승자와 패자] 국가채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본도 9년 만에 등급 하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글로벌 워치…등급 산정 어떻게
거시지표ㆍ정치상황도 평가…신평가 신뢰는 갈수록 추락
거시지표ㆍ정치상황도 평가…신평가 신뢰는 갈수록 추락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한 단계 상승한 A1로 올라섰다. 그럼에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Aa1) 보다 세 단계 낮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경제만을 평가 잣대로 삼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제신평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항목은 한 국가의 채무로,공기업부채 민간채무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를 주로 들여다보지만 외적 변수도 감안하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위험 영향이 크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한 것도 민주화 시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 · 제도와 사회 관행,국민의 의식 수준도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제도와 의식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은 항목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긴 뒤 애널리스트의 분석 결과를 합쳐 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가중치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평사들의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물경제보다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데서 나타나듯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신속하게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평사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3대 신평사가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위기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확산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자마자 국가신용등급을 4단계 강등해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지난해 11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도 등급을 5단계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신용등급 하락이 더해지면서 또다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초래한 주범으로 EU 관리들은 신평사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3대 신평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신평사를 키우는 식으로 기존의 3대 신평사에 도전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중국의 민간 신평사인 다궁(大公)이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 자국 신용등급을 더 높게 평가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를 집중 부각시켰던 게 그런 예다.
강경민/유승호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제신평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항목은 한 국가의 채무로,공기업부채 민간채무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를 주로 들여다보지만 외적 변수도 감안하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위험 영향이 크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한 것도 민주화 시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 · 제도와 사회 관행,국민의 의식 수준도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제도와 의식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은 항목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긴 뒤 애널리스트의 분석 결과를 합쳐 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가중치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평사들의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물경제보다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데서 나타나듯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신속하게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평사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3대 신평사가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위기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확산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자마자 국가신용등급을 4단계 강등해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지난해 11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도 등급을 5단계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신용등급 하락이 더해지면서 또다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초래한 주범으로 EU 관리들은 신평사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3대 신평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신평사를 키우는 식으로 기존의 3대 신평사에 도전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중국의 민간 신평사인 다궁(大公)이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 자국 신용등급을 더 높게 평가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를 집중 부각시켰던 게 그런 예다.
강경민/유승호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