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의 전면적 복지개혁 타산지석 삼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국 정부가 전면적인 복지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구당 수당 총액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복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고 보면 영국의 이 같은 복지 개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상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보편적 복지를 가장 앞서 도입한 국가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그 이후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기존 복지의 틀을 깬 과감한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부하면 3개월간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그 후 1년 내 두 번째 제안을 거절하면 6개월간, 또 그 후 1년내 세 번째 제안을 거부하면 3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체계도 단일화하고 가구당 수혜 한도를 2만6000파운드(약4677만원)로 제한했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키로 한 것은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더이상 방만한 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없게 된 까닭이다. 지난해 3월 말로 끝난 2009~2010 회계연도만 해도 재정적자는 무려 1634억파운드(약 295조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또한 세계 최선두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등 적지 않은 유럽국들이 재정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력을 웃도는 복지 제도가 큰 원인이 됐다. 미국 일본 등이 팽창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축소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치권에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여 · 야가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경쟁적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정책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만 떠안길 뿐이다. 영국의 복지 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영국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상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보편적 복지를 가장 앞서 도입한 국가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그 이후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기존 복지의 틀을 깬 과감한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부하면 3개월간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그 후 1년 내 두 번째 제안을 거절하면 6개월간, 또 그 후 1년내 세 번째 제안을 거부하면 3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체계도 단일화하고 가구당 수혜 한도를 2만6000파운드(약4677만원)로 제한했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키로 한 것은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더이상 방만한 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없게 된 까닭이다. 지난해 3월 말로 끝난 2009~2010 회계연도만 해도 재정적자는 무려 1634억파운드(약 295조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또한 세계 최선두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 등 적지 않은 유럽국들이 재정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력을 웃도는 복지 제도가 큰 원인이 됐다. 미국 일본 등이 팽창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축소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치권에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여 · 야가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경쟁적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정책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만 떠안길 뿐이다. 영국의 복지 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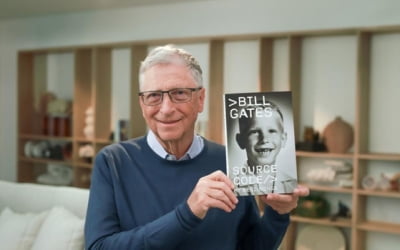

![美, 원유수입 1·2위 캐나다·멕시코에 관세…WTI 시간외 1% 상승 [오늘의 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38700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