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稅보다 기존 복지제도 효율성 높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 토론회 - 복지와 재정건전성
현 수준만 유지해도 큰 부담…스웨덴도 복지지출 감소 추세
조세체계 고치면 수십조 확보…국민부담 크게 늘지 않아
현 수준만 유지해도 큰 부담…스웨덴도 복지지출 감소 추세
조세체계 고치면 수십조 확보…국민부담 크게 늘지 않아
"선진국도 고부담 · 고복지 모델을 버리고 국민 세금 부담과 복지 지출을 줄여가는 추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 기반 확충 등 조세 체계 합리화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정책과 조세부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23일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졌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도 국민 부담 축소"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의 현재 복지예산 규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조 교수는 "올해 정부의 복지 예산은 86조원,총지출 대비 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팽창할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선진국에 못 미친다고 해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다"며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급증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복지 확대가 국민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스웨덴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한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의료도 재원 구조를 따져보면 근로자들의 월급을 국가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눠 준 것에 불과했다"며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부담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시급"
증세 등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1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지만 보장률은 10%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며 복지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용만 증가하고 효과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단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정책 조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준모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조차 자칫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라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금은 성장도 위기이고 복지도 위기"라며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장 전략과 복지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이상은 기자 usho@hankyung.com
"과세 기반 확충 등 조세 체계 합리화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정책과 조세부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23일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졌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도 국민 부담 축소"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의 현재 복지예산 규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조 교수는 "올해 정부의 복지 예산은 86조원,총지출 대비 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팽창할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선진국에 못 미친다고 해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다"며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급증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복지 확대가 국민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스웨덴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한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의료도 재원 구조를 따져보면 근로자들의 월급을 국가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눠 준 것에 불과했다"며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부담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시급"
증세 등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1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지만 보장률은 10%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며 복지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용만 증가하고 효과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단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정책 조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준모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조차 자칫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라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금은 성장도 위기이고 복지도 위기"라며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장 전략과 복지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이상은 기자 ush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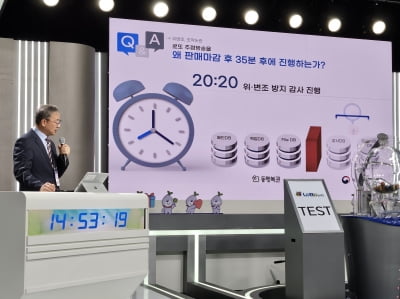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