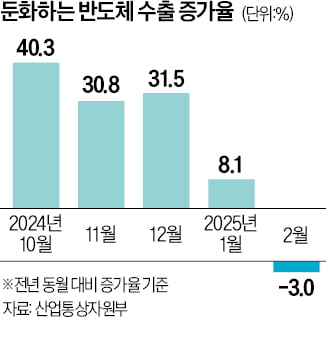이서현 부사장 "빈폴, 최상급 매스티지로 키워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출 5000억 '성장의 늪' 경계
브랜드 업그레이드 주문
해외 명품 들여오는 대신
최고가 빈폴 컬렉션 강화
브랜드 업그레이드 주문
해외 명품 들여오는 대신
최고가 빈폴 컬렉션 강화
무한 질주하던 빈폴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건 2007년이었다. 2005~2006년 2년 연속 17%대를 기록했던 매출 성장률이 3%대로 뚝 떨어진 것.금액으로 치면 3760억원에서 3860억원으로 고작 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계는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국내 패션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그 정도가 '맥시멈'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제일모직 패션 부문을 이끄는 이서현 부사장(38 · 사진)의 생각은 달랐다. 매출이 정체된 건 제품 자체의 '매력'을 높이지 못한 채 마케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부사장은 그길로 각 파트에 소속된 디자이너들로 디자인실을 독립시켰다. '당장 잘 팔릴 옷을 만들라'는 상품기획자(MD)들의 압박에서 벗어난 디자이너들은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덕분에 빈폴의 매출 성장률은 2008년 6%로 올라섰고,이듬해에는 17%대를 회복했다. 작년엔 국내 패션 브랜드 중 처음으로 매출 5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4년 전 '디자인 경영'을 통해 빈폴 성장 모멘텀을 제시했던 이 부사장은 최근 '브랜드 경영'이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외형 성장은 잠시 머리에서 지우고,빈폴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들여오는 대신,빈폴을 '매스티지(대중 명품) 군의 최상급 브랜드'로 격상시키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엠포리오 아르마니,D&G,마크 바이 마크제이콥스 등 명품의 세컨드 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준명품 브랜드로 빈폴을 키우려는 계획이다.
고유현 제일모직 빈폴 컴퍼니장(상무)은 24일 "특정 패션 브랜드가 너무 많이 판매돼 '흔하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곧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이 부사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매출 5000억원을 넘긴 빈폴이 이런 '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외형 성장보다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매진하자고 이 부사장이 최근 열린 전략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올해를 기점으로 '빈폴 이미지 업그레이드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빈폴 제품 가운데 최고가인 '빈폴 컬렉션'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컬렉션 라인이 명품 반열에 오르면 다른 빈폴 제품의 이미지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최근 컬렉션 라인 전용 디자이너를 추가로 채용,올봄 시즌 상품 수를 작년보다 30%가량 늘렸다. 컬렉션 라인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빈폴 매장 수도 지금의 9곳에서 연내 1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3~4년 뒤에는 아예 컬렉션 제품으로만 구성된 단독 매장도 낼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 패션 선진시장 진출도 추진키로 했다. 빈폴 컬렉션이 주력시장인 한국과 중국에서 글로벌 준명품급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선 선진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하지만 제일모직 패션 부문을 이끄는 이서현 부사장(38 · 사진)의 생각은 달랐다. 매출이 정체된 건 제품 자체의 '매력'을 높이지 못한 채 마케팅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부사장은 그길로 각 파트에 소속된 디자이너들로 디자인실을 독립시켰다. '당장 잘 팔릴 옷을 만들라'는 상품기획자(MD)들의 압박에서 벗어난 디자이너들은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덕분에 빈폴의 매출 성장률은 2008년 6%로 올라섰고,이듬해에는 17%대를 회복했다. 작년엔 국내 패션 브랜드 중 처음으로 매출 5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4년 전 '디자인 경영'을 통해 빈폴 성장 모멘텀을 제시했던 이 부사장은 최근 '브랜드 경영'이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외형 성장은 잠시 머리에서 지우고,빈폴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들여오는 대신,빈폴을 '매스티지(대중 명품) 군의 최상급 브랜드'로 격상시키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엠포리오 아르마니,D&G,마크 바이 마크제이콥스 등 명품의 세컨드 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준명품 브랜드로 빈폴을 키우려는 계획이다.
고유현 제일모직 빈폴 컴퍼니장(상무)은 24일 "특정 패션 브랜드가 너무 많이 판매돼 '흔하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곧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이 부사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매출 5000억원을 넘긴 빈폴이 이런 '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외형 성장보다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매진하자고 이 부사장이 최근 열린 전략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올해를 기점으로 '빈폴 이미지 업그레이드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빈폴 제품 가운데 최고가인 '빈폴 컬렉션'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컬렉션 라인이 명품 반열에 오르면 다른 빈폴 제품의 이미지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최근 컬렉션 라인 전용 디자이너를 추가로 채용,올봄 시즌 상품 수를 작년보다 30%가량 늘렸다. 컬렉션 라인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빈폴 매장 수도 지금의 9곳에서 연내 1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3~4년 뒤에는 아예 컬렉션 제품으로만 구성된 단독 매장도 낼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 패션 선진시장 진출도 추진키로 했다. 빈폴 컬렉션이 주력시장인 한국과 중국에서 글로벌 준명품급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선 선진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