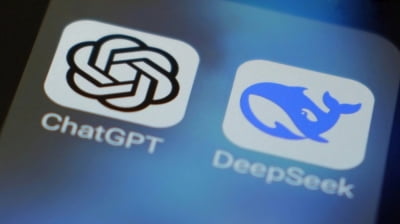"통일비용, 北주민 경제활동 자립에 초점 맞춰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일비용 추정과 향후 투입은 북한 주민들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박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남북관계 그리고 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는다'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통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통일비용 산출연구는 대부분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소득격차 해소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일정책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이는 소득격차 감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독일 통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통독 당시 서독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던 동독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이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자체적인 통합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 고용인 1인당 보수수준은 1991년 49%에서 1995년 74%로 오른 후 2007년까지 77% 수준으로 답보상태에 있고, 실업률도 서독지역의 2배가 넘는다"면서 "통일된 국가가 예전에 누릴 수 없던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심어줘야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비 보전과 높은 복지비용 지출은 오히려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더디게 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투입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의료시설과 의약품 지원, 교육분야 투자에 집중해 북한주민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남한기업들에 있어 통일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돕고, 남한 주민들이 북한 노동력과 자원 등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통일 후 남북한 지역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상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박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남북관계 그리고 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는다'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통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통일비용 산출연구는 대부분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소득격차 해소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일정책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이는 소득격차 감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독일 통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통독 당시 서독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던 동독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이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자체적인 통합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 고용인 1인당 보수수준은 1991년 49%에서 1995년 74%로 오른 후 2007년까지 77% 수준으로 답보상태에 있고, 실업률도 서독지역의 2배가 넘는다"면서 "통일된 국가가 예전에 누릴 수 없던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심어줘야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비 보전과 높은 복지비용 지출은 오히려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더디게 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투입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의료시설과 의약품 지원, 교육분야 투자에 집중해 북한주민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남한기업들에 있어 통일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돕고, 남한 주민들이 북한 노동력과 자원 등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통일 후 남북한 지역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