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시늉만] 공기업, IPO 수수료 후려치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사, 실적 쌓으려 '출혈경쟁'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담당자들에게 공기업 민영화 관련 딜은 '최악'으로 꼽힌다. 딜을 따내기 위해 무조건 수수료부터 싸게 써 내는 관행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기업공개(IPO)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제값받기보다는 수수료 깎는 데 혈안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출혈경쟁은 2009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IPO가 단초가 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공모금액 대비 0.01% 수수료율을 적어내 주관사를 따냈다. 공모규모가 1조원이라면 IPO 수수료는 고작 1억원인 셈이다. 이후 증권사들 사이에는 공기업 IPO 주관사를 따내려면 수수료율이 0.5%를 넘겨선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민간기업 IPO 수수료율이 1~2%대인 것과 천양지차다.
작년 우리금융 블록세일(주식 대량매각)도 매각 주관사인 삼성 · 대우 · UBS · 크레디스위스 등 4개 증권사가 0~0.02%를 기본 수수료로 받았다. 2009년 말 인천공항공사 IPO 주관사로 선정된 삼성증권 컨소시엄도 기본 수수료로 0.1%만 써 냈는데 그나마 IPO를 언제 추진할지 기약이 없다.
유독 공기업 민영화 딜에 증권사 간 출혈경쟁이 심한 것은 공기업들이 주관사 선정 시 수수료 비중을 높게 반영하는 입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입찰은 수수료 배점이 20%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기술평가(80%)는 여러 증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완이 가능하므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딜을 따내야 IB부문 트랙레코드(실적)가 강화돼 앞으로 줄줄이 나올 민영화 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IB시장에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수료 덤핑에 나선다. 한 증권사 IB담당 임원은 "트랙레코드를 쌓기 위해 헐값에 민영화 딜의 주관을 맡으면 회사 요구에 휘둘려 공모가 산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이 같은 출혈경쟁은 2009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IPO가 단초가 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공모금액 대비 0.01% 수수료율을 적어내 주관사를 따냈다. 공모규모가 1조원이라면 IPO 수수료는 고작 1억원인 셈이다. 이후 증권사들 사이에는 공기업 IPO 주관사를 따내려면 수수료율이 0.5%를 넘겨선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민간기업 IPO 수수료율이 1~2%대인 것과 천양지차다.
작년 우리금융 블록세일(주식 대량매각)도 매각 주관사인 삼성 · 대우 · UBS · 크레디스위스 등 4개 증권사가 0~0.02%를 기본 수수료로 받았다. 2009년 말 인천공항공사 IPO 주관사로 선정된 삼성증권 컨소시엄도 기본 수수료로 0.1%만 써 냈는데 그나마 IPO를 언제 추진할지 기약이 없다.
유독 공기업 민영화 딜에 증권사 간 출혈경쟁이 심한 것은 공기업들이 주관사 선정 시 수수료 비중을 높게 반영하는 입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입찰은 수수료 배점이 20%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기술평가(80%)는 여러 증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완이 가능하므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딜을 따내야 IB부문 트랙레코드(실적)가 강화돼 앞으로 줄줄이 나올 민영화 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IB시장에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수료 덤핑에 나선다. 한 증권사 IB담당 임원은 "트랙레코드를 쌓기 위해 헐값에 민영화 딜의 주관을 맡으면 회사 요구에 휘둘려 공모가 산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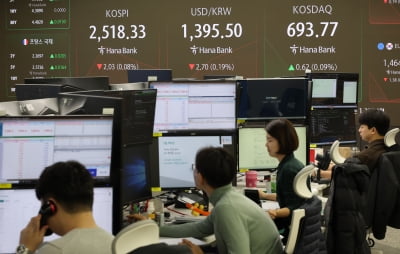
!["HBM 좋지만…" 증권가 'SK하이닉스 목표가' 낮추는 이유 [종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418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