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량 요오드·세슘 걱정할 필요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서울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제논·요오드·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매우 적은 양이나마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검출된 양이 극미한 수준으로, 사람이 쪼이는 방사선량도 자연 상태의 피폭량 수준보다 크게 낮아 임산부나 어린이들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세슘의 경우 반감기(30년)가 길어 오랜 시간에 걸쳐 생태계의 일부로 남아 순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승숙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은) 임산부나 어린이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임산부나 아이의 경우라도 방사선 수준이 50mSv 이상 정도가 돼야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당시 핀란드에서 과도한 공포심으로 해독제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원전 인근 지역에 사는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갑상선암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암 발생률의 차이가 없었다.
물론 방사선 요오드나 세슘은 자연환경에서 원래 검출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요오드가 수용성이라서 빗물에 녹기는 하지만 머리에 묻더라도 미량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찜찜하다면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 윤세철 방사선방어학회장(서울성모병원 교수) =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됐다고 해도 극미량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오드나 세슘을 만약에 흡입하거나 삼켰다고 해도 대부분은 배출되고, 배출되지 않고 남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적으면 방출하는 방사선량도 미미해 X-레이 사진 한 번 찍는 것보다 훨씬 피폭량이 적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반감기가 8일 정도로 짧아 곧 사라진다.
다만 세슘의 경우 반감기가 30년 정도로 긴 만큼 영향을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극미량이라도 비를 통해 토양으로 흡수되고, 다시 식물과 동물 등으로 옮겨지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 생태계에 남아 순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박선희 식약청 식품기준과장 = 사실 엄밀히 말해 방사선량에 어느 정도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
적을수록 좋다.
다만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도 일부 국가들은 바다에 몰래 핵폐기물을 버려 전세계 바다가 오염됐을 것이고, 중국이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방사선 낙진이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이번 낙진(방사성 물질)이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방사성 먼지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더라도 채소는 잘 씻어 먹으면 된다.
방사능 오염 토양에서 채소가 뿌리부터 방사성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씻으면 흘러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피가 필요한 수준의 공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채소에 축적되는 방사선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임산부는 무엇이든 음식 섭취에 주의해야겠지만, 과도한 공포감은 스트레스를 가져와 태아의 정신발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장순흥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핵분열 때 생성되는 물질 가운데 요오드는 양이 많은 대신 반감기가 짧고, 세슘은 양이 적은 반면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되는 정도의 양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안정화요오드(KI)로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상황은 KI를 찾아야 할 단계도 아니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왔느냐,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양과 농도를 보고 방사선량을 따져야 한다.
내부·외부 피폭에 상관없이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보다 적은 수준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세영 기자 shk999@yna.co.krthedopest@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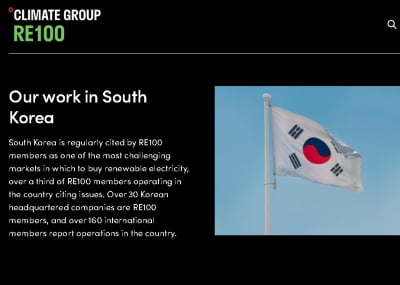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