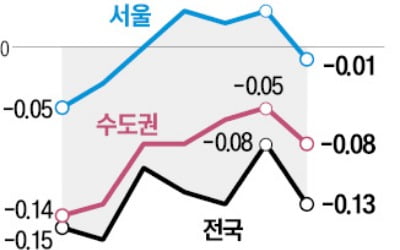[건설사 'PF공포'] 헌인마을 2년간 하루 이자만 1억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PF 인·허가 리스크 크다
건설사를 좌초시킨 내곡동 헌인마을과 양재동 파이시티 등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고 인 · 허가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 사업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건설사 시행사(디벨로퍼) 등은 '인 · 허가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불안해 하고 있다.
화물터미널을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파이시티는 2004년 5월 인 · 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길게 잡아 1년 정도로 예상했던 인 · 허가는 2009년 11월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200억원이다. 5년반 동안 금융회사에 낸 이자와 수수료만 4500억원으로 원금의 72%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짓는 헌인마을 개발사업도 인 · 허가에 2년 가까이를 허비했다. 차입금 4270억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 1억원에 달하면서 사업성은 크게 나빠졌다. 시행사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를 3.3㎡당 5000만원에 책정하기로 했지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사업 전망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금융권은 PF 만기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인 · 허가 지연에 대한 서울시와 건설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와 감사를 두려워해 결재를 하지 않으려 했다"며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업성이 나빠지고 금융사들도 PF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할 때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면 인 · 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 하나의 인 · 허가 리스크에도 건설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데 있다. 비교적 탄탄한 건설사들도 대형 사업 하나때문에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초대형 PF 사업장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성근/이정선 기자 truth@hankyung.com
화물터미널을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파이시티는 2004년 5월 인 · 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길게 잡아 1년 정도로 예상했던 인 · 허가는 2009년 11월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200억원이다. 5년반 동안 금융회사에 낸 이자와 수수료만 4500억원으로 원금의 72%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짓는 헌인마을 개발사업도 인 · 허가에 2년 가까이를 허비했다. 차입금 4270억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 1억원에 달하면서 사업성은 크게 나빠졌다. 시행사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를 3.3㎡당 5000만원에 책정하기로 했지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사업 전망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금융권은 PF 만기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인 · 허가 지연에 대한 서울시와 건설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와 감사를 두려워해 결재를 하지 않으려 했다"며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업성이 나빠지고 금융사들도 PF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할 때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면 인 · 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 하나의 인 · 허가 리스크에도 건설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데 있다. 비교적 탄탄한 건설사들도 대형 사업 하나때문에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초대형 PF 사업장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성근/이정선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