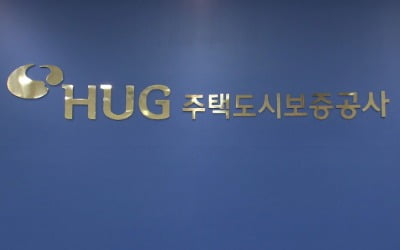[건설사 'PF공포'] 대형 건설사, 해외공사로 '버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업계는 중견 건설사에서 비롯된 '붕괴 도미노'가 대형 건설사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 금융권 등에선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가 위험하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계 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중견 건설사나 대형 건설사나 비슷한 처지다. 2007년부터 수도권 미분양 적체로 5년째 주택시장 업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공공공사에선 계속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한번씩 호황을 겪으며 건설사 재무상태를 호전시켜야 하는데 그런 안전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토목 부문의 매출 비중이 70%인 삼부토건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충격파는 만만찮다.
위기의 뇌관이 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신규로 일으킬 수 있는 건설사도 8~9개사에 불과하다. 대형 건설사 재무팀 관계자는 "신규 PF대출을 받으려면 채권 신용등급이 'A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런 업체는 8~9개에 불과하다"며 "A- 등급의 대형사는 PF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동 민주화 시위 등으로 주택 · 건축 · 토목 · 해외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좋은 곳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중동사태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 급감이 서서히 현실화되면 계약에 따른 선수금(전체 공사대금의 15%가량) 유입도 줄어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지만 '2%'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V자형 경제 회복에 들떠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며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떠받쳐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예상이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 건축시장에서 경기 회복이 앞당겨지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이 충격 완충장치를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해외 · 플랜트 · 토목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긴 이익으로 주택분야 대손충당금을 쌓는 곳이 많다. 업체별로 연간 5000억~1조원 규모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전에는 대손충당금을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했지만 올해부터 영업비용으로 잡혀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란 점에서 위안이 된다.
중견사들의 경우 PF 보증채무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곳이 많지만 대형 건설사는 드물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사로 일감이 몰리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