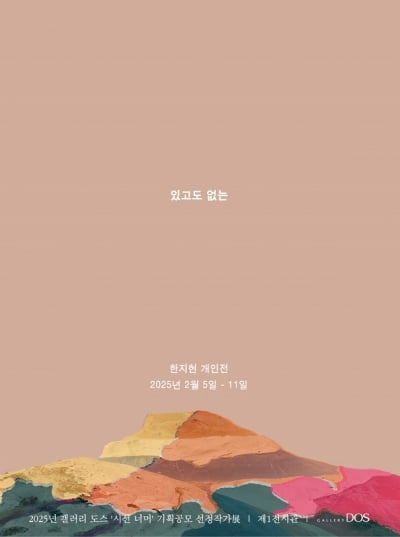[박성희의 곁에 두고 싶은 책] 71세 영조가 열두살 정조에게 "1만권 책을 읽어도 실천 않으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선 명문가 독서교육법/이상주 지음/다음생각/340쪽/1만4000원
'나는 항상 늦게 공부한 걸 한탄한다. 너는 어린 나이에 수준 높은 책을 읽고 있구나. 할아버지에 비해 학식이 많아 다행이다. 그러나 1만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토론에 익숙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앵무새와 다를 바 없다. ' 영조가 71세 때 열두 살짜리 손자 이산(정조)에게 이른 말이다.
독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란 얘기다. 언론인이자 종묘대제 및 능제향 전수자인 저자는 조선 명문가의 기준은 '문형(文衡 · 대제학)' 배출 유무였다고 말한다. 문형이란 저울로 물건을 달듯 글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뜻.대제학이 나온 명문가엔 따라서 책은 어떻게 읽으라는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책은 그런 명문가의 독서 지침을 한곳에 모아 보여준다.
저서 · 문집 · 가훈 등에 드러난 독서의 이유는 간단하다. '독서는 나의 힘'이라는 게 그것이다. 종3품 사간 및 함양과 한산 수령을 지낸 권양(1688~1758)은 '영가지족당가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어린 시절 궁색했다. 행동도 느리고 머리도 뛰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힘써 공부했다,천신만고 끝에 과거에 급제했다. '
자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는 조언도 있다. '독서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반복해 읽어 마음을 깊이 붙여야 한다. 어느 순간 얻는 바가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 그 뜻을 언어에만 의지하지 말라.' 퇴계 이황과 긴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1527~1572)은 또 글이란 슬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읽고 생각한 뒤 글을 지으라고 얘기했다.
독서와 공부는 언제나 힘든 법.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열흘만 참으면 습관이 든다고 말했다. '처음엔 누구나 힘들다. 이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안함만 찾는다면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지 못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인내하면 열흘 안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점점 사라지고 드넓은 독서세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아버지나 형이 먼저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것과 금지해야 할 것을 말해야 제대로 이뤄진다'(이경근 · 1824~1889).그런가 하면 아들 · 손자 · 증손자가 모두 문형에 오르고 그 자신이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1585~1657)는 칼에 새겨 남긴 '백강공수잠장도명(白江公手箴 粧刀銘)'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당부했다. '시간은 빨리 가고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해도 소용 없다. '
숙종의 명으로 문집 '미수기언'을 간행한 허목(1595~1682)은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묻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앎에 이르기 전에 성실함이 필요하고 안 뒤엔 더 성실해야 일이 이뤄진다. 요즘 사람은 실천에 앞서 의견부터 내세운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가볍다. '사람살이란 게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독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란 얘기다. 언론인이자 종묘대제 및 능제향 전수자인 저자는 조선 명문가의 기준은 '문형(文衡 · 대제학)' 배출 유무였다고 말한다. 문형이란 저울로 물건을 달듯 글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뜻.대제학이 나온 명문가엔 따라서 책은 어떻게 읽으라는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책은 그런 명문가의 독서 지침을 한곳에 모아 보여준다.
저서 · 문집 · 가훈 등에 드러난 독서의 이유는 간단하다. '독서는 나의 힘'이라는 게 그것이다. 종3품 사간 및 함양과 한산 수령을 지낸 권양(1688~1758)은 '영가지족당가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어린 시절 궁색했다. 행동도 느리고 머리도 뛰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힘써 공부했다,천신만고 끝에 과거에 급제했다. '
자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는 조언도 있다. '독서는 옛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반복해 읽어 마음을 깊이 붙여야 한다. 어느 순간 얻는 바가 있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 그 뜻을 언어에만 의지하지 말라.' 퇴계 이황과 긴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1527~1572)은 또 글이란 슬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읽고 생각한 뒤 글을 지으라고 얘기했다.
독서와 공부는 언제나 힘든 법.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열흘만 참으면 습관이 든다고 말했다. '처음엔 누구나 힘들다. 이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안함만 찾는다면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지 못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인내하면 열흘 안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점점 사라지고 드넓은 독서세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아버지나 형이 먼저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것과 금지해야 할 것을 말해야 제대로 이뤄진다'(이경근 · 1824~1889).그런가 하면 아들 · 손자 · 증손자가 모두 문형에 오르고 그 자신이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1585~1657)는 칼에 새겨 남긴 '백강공수잠장도명(白江公手箴 粧刀銘)'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당부했다. '시간은 빨리 가고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해도 소용 없다. '
숙종의 명으로 문집 '미수기언'을 간행한 허목(1595~1682)은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묻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앎에 이르기 전에 성실함이 필요하고 안 뒤엔 더 성실해야 일이 이뤄진다. 요즘 사람은 실천에 앞서 의견부터 내세운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가볍다. '사람살이란 게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