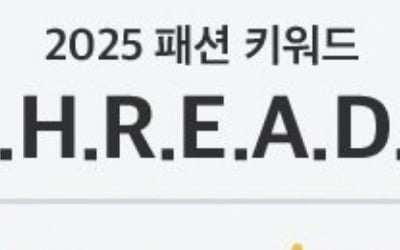[책마을] 행복ㆍ생명ㆍ신앙에도 '보이지 않는 가격 메커니즘' 작동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든 것의 가격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손민중·김홍래 옮김/김영사/364쪽/1만4000원
손익·기회비용 따라 선택
서브프라임 사태 집값처럼
통제 안되는 가격 가장 위험
손익·기회비용 따라 선택
서브프라임 사태 집값처럼
통제 안되는 가격 가장 위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20여년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을 때 한 문건에 서명했다. 부유한 나라의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에 수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난한 나라는 임금이 낮아서 쓰레기장의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국가적 손실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1991년 말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공개된 이 문서를 본 관계자들은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앨 고어 부통령은 서머스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 될 기회를 가로막았다. 브라질의 전 환경장관 호세 룩셈베르거는 서머스의 논거가 "전적으로 논리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상식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논거는 그리 낯선 게 아니다. 쓰레기도 다른 물건들과 똑같은 가치체계의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에 매기는 가격 역시 그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과 이윤의 함수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환경과 정의의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면 헌 페트병이 가득 든 자루더미가 뉴욕보다 인도에서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다.
《모든 것의 가격》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택들이 여러 대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격이 인간 행동과 정책 결정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아이들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자는 물론 생명 행복 공짜 신앙 미래에까지 가격과 관련된 논의의 폭을 넓힌다. 새로운 논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이해타산과 손익계산,즉 기회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사례가 풍부해 재미있게 읽히는 게 강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기업들은 이들 차이를 파고들어 가능한 한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려고 노력한다. 2008년도 자갓 레스토랑 안내서 뉴욕편의 사례가 재미있다. 낭만적이거나 독신자에게 어울린다고 분류된 레스토랑은 전채와 후식이 메인 요리보다 비싸게 매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연인들이 길게 식사하며 전채는 물론 후식까지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이들 '낭만적 품목'의 가격을 높게 매겼다는 설명이다.
생명에도 하나 이상의 가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명에 결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생텍쥐페리의 묵상은 유효하지 않다. 9 · 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희생자 각각의 목숨가격이 계산됐다. 희생자의 포기된 생산함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해 보상금 규모가 결정됐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종교가 일련의 거래로 구성돼 있고,신자들은 신앙의 혜택과 비용을 저울질한다고 주장한다. 믿음에 따른 혜택의 가격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경우가 많다. 여성이 일을 해 버는 돈이 남성보다 적어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들여도 포기한 소득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층은 온건한 종교를,교육 수준이 낮은 층은 엄격한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이 높아 시간에 대한 손실이 큰 사람은 엄격한 신앙 규율 때문에 잃을 것이 많아 순한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가하면 '공짜의 가격'은 '공짜'라는 환상 속에 숨어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에서 학생들에게 10달러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1달러에 사거나 2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8달러에 사라는 제안을 했더니 3분의 2가 20달러짜리를 택했다고 한다. 전자의 이득이 9달러,후자가 12달러여서다. 그러나 두 카드의 가격을 각각 1달러씩 낮춰 부르자 모두 10달러짜리를 택했다. 20달러짜리를 7달러에 사면 13달러의 이득을 얻지만 10달러로 이득이 줄어도 100% 공짜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자는 가격이 특정한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고 재삼 강조한다.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디에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가격이란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주택 가격처럼 통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1991년 말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공개된 이 문서를 본 관계자들은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앨 고어 부통령은 서머스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 될 기회를 가로막았다. 브라질의 전 환경장관 호세 룩셈베르거는 서머스의 논거가 "전적으로 논리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상식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논거는 그리 낯선 게 아니다. 쓰레기도 다른 물건들과 똑같은 가치체계의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에 매기는 가격 역시 그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과 이윤의 함수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환경과 정의의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면 헌 페트병이 가득 든 자루더미가 뉴욕보다 인도에서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다.
《모든 것의 가격》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택들이 여러 대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격이 인간 행동과 정책 결정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아이들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자는 물론 생명 행복 공짜 신앙 미래에까지 가격과 관련된 논의의 폭을 넓힌다. 새로운 논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이해타산과 손익계산,즉 기회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사례가 풍부해 재미있게 읽히는 게 강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기업들은 이들 차이를 파고들어 가능한 한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려고 노력한다. 2008년도 자갓 레스토랑 안내서 뉴욕편의 사례가 재미있다. 낭만적이거나 독신자에게 어울린다고 분류된 레스토랑은 전채와 후식이 메인 요리보다 비싸게 매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연인들이 길게 식사하며 전채는 물론 후식까지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이들 '낭만적 품목'의 가격을 높게 매겼다는 설명이다.
생명에도 하나 이상의 가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명에 결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생텍쥐페리의 묵상은 유효하지 않다. 9 · 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희생자 각각의 목숨가격이 계산됐다. 희생자의 포기된 생산함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해 보상금 규모가 결정됐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종교가 일련의 거래로 구성돼 있고,신자들은 신앙의 혜택과 비용을 저울질한다고 주장한다. 믿음에 따른 혜택의 가격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경우가 많다. 여성이 일을 해 버는 돈이 남성보다 적어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들여도 포기한 소득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층은 온건한 종교를,교육 수준이 낮은 층은 엄격한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이 높아 시간에 대한 손실이 큰 사람은 엄격한 신앙 규율 때문에 잃을 것이 많아 순한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가하면 '공짜의 가격'은 '공짜'라는 환상 속에 숨어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에서 학생들에게 10달러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1달러에 사거나 2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8달러에 사라는 제안을 했더니 3분의 2가 20달러짜리를 택했다고 한다. 전자의 이득이 9달러,후자가 12달러여서다. 그러나 두 카드의 가격을 각각 1달러씩 낮춰 부르자 모두 10달러짜리를 택했다. 20달러짜리를 7달러에 사면 13달러의 이득을 얻지만 10달러로 이득이 줄어도 100% 공짜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자는 가격이 특정한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고 재삼 강조한다.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디에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가격이란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주택 가격처럼 통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