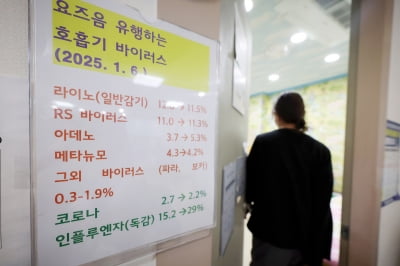부자(父子)에게 무슨 사연으로 2대째 같은 학교에서 교수를 하게 됐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 한번도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대학을 선택할 때 '서강학파'로 이름을 날리던 서강대 경제학과가 어떻겠느냐고 조언(?)한 적은 있다"며 겸연쩍어했다.
그는 "서강대가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수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사학 명문이 되긴 했지만 당시 교수들 중엔 여전히 자식은 서울대로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학교가 진정한 명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기대대로 서강대를 선택한 아들은 입학부터 1980년 졸업까지 전체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집에서 언제나 책을 읽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회상했다.
1995년까지 같이 부자가 함께 근무할 때는 에피소드도 많았다. 아들은 "한번은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양복을 맞췄는데 그 양복만 입고 가면 동료 교수들이 '또 아버지 옷 빌려입었느냐'고 놀려대곤 했다"며 "마주치면 불편한 일이 많아 되도록 학교에선 아버지를 피해다니곤 했다"고 털어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