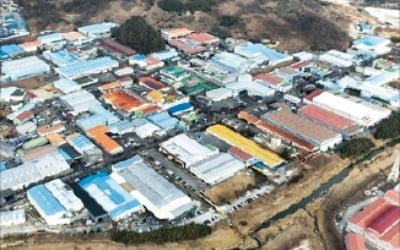[인류, 질병과의 싸움 언제까지] 질병 발생하면 '네 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글로벌 워치
獨 "아시아서 유입 가능성"
獨 "아시아서 유입 가능성"
독일에서 장출혈성대장균(EHEC)이 유행하자 독일 정부는 처음에 "EHEC 바이러스가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로 양국 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책임 문제까지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산 오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독일은 이번에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전염병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게르트 린더만 농업장관은 "콩류 새싹이 오염원일 수도 있다"며 "과거 아시아에서도 새싹에 의해 EHEC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6년 일본에서 EHEC에 오염된 무순을 먹고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다. 뉴욕타임스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 발언을 인용,"유럽에서 퍼지는 EHEC가 1990년대 한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익숙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병의 기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세계 각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5~16세기 유럽에서 매독이 유행하자 프랑스에선 매독을 '나폴리병''이탈리아병'이라고 불렀다.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영국에선 프랑스인이 가져온 병이란 뜻에서 '프랑스병'이라고 명명했다. 스페인과 대립했던 네덜란드는 '스페인병'이라고 이름 붙였고 포르투갈에선 경쟁 관계에 있던 카스티야를 지목,'카스티야병'이라고 호칭했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에선 '폴란드병',오스만튀르크에선 '기독교병'이라며 기피했다. 일본에서도 '중국병'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1980년대 에이즈 확산이 본격화되자 현대판 '신의 징벌'인 에이즈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원숭이 기원설 △아이티 기원설 △남성 동성애자 기원설 △구소련과 미국의 생물학 무기 기원설 등 외부기원설이 제기됐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하지만 스페인산 오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독일은 이번에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전염병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게르트 린더만 농업장관은 "콩류 새싹이 오염원일 수도 있다"며 "과거 아시아에서도 새싹에 의해 EHEC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6년 일본에서 EHEC에 오염된 무순을 먹고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다. 뉴욕타임스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 발언을 인용,"유럽에서 퍼지는 EHEC가 1990년대 한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익숙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병의 기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세계 각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5~16세기 유럽에서 매독이 유행하자 프랑스에선 매독을 '나폴리병''이탈리아병'이라고 불렀다.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영국에선 프랑스인이 가져온 병이란 뜻에서 '프랑스병'이라고 명명했다. 스페인과 대립했던 네덜란드는 '스페인병'이라고 이름 붙였고 포르투갈에선 경쟁 관계에 있던 카스티야를 지목,'카스티야병'이라고 호칭했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에선 '폴란드병',오스만튀르크에선 '기독교병'이라며 기피했다. 일본에서도 '중국병'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1980년대 에이즈 확산이 본격화되자 현대판 '신의 징벌'인 에이즈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원숭이 기원설 △아이티 기원설 △남성 동성애자 기원설 △구소련과 미국의 생물학 무기 기원설 등 외부기원설이 제기됐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