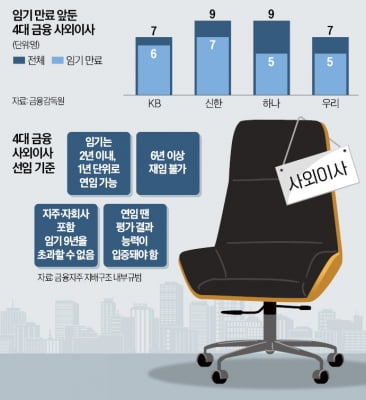박범신 "선생·부모 역할 끝냈으니 작가생활 전념해야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 교수 퇴임식 갖는 소설가 박범신
"여름이 지나면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작가로만 남게 됩니다. 문화단체에서 맡았던 감투들도 정리하고 고향인 논산에 내려가 강력한 표창을 든 '청년 작가'로 소설에 미쳐볼 생각입니다. "
소설가 박범신 씨(65 · 사진)는 다음달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장편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문예중앙 펴냄)의 출판기념회 겸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오는 8월 말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지인과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대학교수 외에도 중 · 고교 전임강사 시절을 포함하면 그는 꼭 28년간 '선생 생활'을 했단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 39년을 보냈는데 다음달 말에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애프터 서비스'할 일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노릇도 끝나는 것이고 강의도 그만두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세 가지 역할 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어서 늘 차선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타협 없이 작가로서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
그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지만 "가르치는 일에는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학기에 적어도 2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읽는 것이 힘들기도 했으려니와 무엇보다 제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학평수업'은 일종의 악업을 짓는 느낌이었다는 설명이다.
1970~80년대 연재소설 등을 내며 '인기 작가'의 타이틀을 얻은 박씨지만 스스로를 가리켜 '끊임없은 소재와 결코 늙지 않는 날 선 문장으로 문학순정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 작가'라고 말한다. 그는 "작가생활 39년 동안 대략 소설을 39권쯤 썼는데 마치 한 권을 쓴 것 같다"며 "작가는 독자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예술가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그의 신작 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는 박씨가 한 미국 시인의 시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제목으로 손바닥이 말굽으로 변하는 한 남자의 살인 기록을 담은 소설이다. 단식원 등 자연치유 시설을 운영하는 '이사장'과 끔찍한 과거를 가진 남자 '나'가 중심 인물인데 속도감 있고 강력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 고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소설가 박범신 씨(65 · 사진)는 다음달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장편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문예중앙 펴냄)의 출판기념회 겸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오는 8월 말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지인과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대학교수 외에도 중 · 고교 전임강사 시절을 포함하면 그는 꼭 28년간 '선생 생활'을 했단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 39년을 보냈는데 다음달 말에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애프터 서비스'할 일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노릇도 끝나는 것이고 강의도 그만두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세 가지 역할 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어서 늘 차선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타협 없이 작가로서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
그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지만 "가르치는 일에는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학기에 적어도 2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읽는 것이 힘들기도 했으려니와 무엇보다 제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학평수업'은 일종의 악업을 짓는 느낌이었다는 설명이다.
1970~80년대 연재소설 등을 내며 '인기 작가'의 타이틀을 얻은 박씨지만 스스로를 가리켜 '끊임없은 소재와 결코 늙지 않는 날 선 문장으로 문학순정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 작가'라고 말한다. 그는 "작가생활 39년 동안 대략 소설을 39권쯤 썼는데 마치 한 권을 쓴 것 같다"며 "작가는 독자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예술가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그의 신작 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는 박씨가 한 미국 시인의 시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제목으로 손바닥이 말굽으로 변하는 한 남자의 살인 기록을 담은 소설이다. 단식원 등 자연치유 시설을 운영하는 '이사장'과 끔찍한 과거를 가진 남자 '나'가 중심 인물인데 속도감 있고 강력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 고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몰락한 세계 2차 대전 요새…다시 일으킬 열쇠는? [K조선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28023.3.jpg)
!["중국인 반응 폭발"…'6000만원 車' 보름 만에 13만대 팔렸다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31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