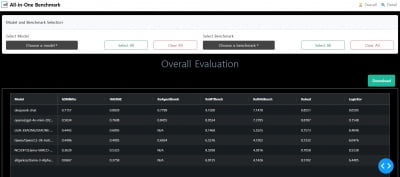[똑똑한 연금설계] 아직도 집 한채로 노후 준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 사적 연금 규모 GDP의 17%…OECD 34개국 평균은 67%
자산 대부분 부동산 편중 연금 등 금융자산 다양화해야
자산 대부분 부동산 편중 연금 등 금융자산 다양화해야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나 정작 노후 준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규모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사적연금,GDP의 4분의 1에도 못 미쳐
지난해 말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개인연금 158조원,퇴직연금 45조원 등 203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172조원)의 17.3%다. 2009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67.1%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9.8%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101.2%) 호주(82.3%) 핀란드(76.8%) 영국(73.0%) 미국(67.8%) 등 순이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40~50%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두 가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이 42%로 OECD 평균(68%)이나 미국(79%) 일본(6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돈이 퇴직 전 소득의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비금융자산 비율 80%
한국은 또 은퇴자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가계의 부동산 의존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은 79.6%였다. 미국(35.1%) 영국(54.8%) 일본(41.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5년 60.5%였던 금융자산 비중이 작년에는 65% 수준으로 높아졌다. 영국과 일본도 45~60%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소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구 고령화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점차 감소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는 이런 리스크를 한 몸에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도 현금 · 예금 편중
20%에 불과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도 그나마 대부분 현금과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다 보니 노부모나 자녀에게 '급전'이 들어갈 일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2%에서 지난해 2분기 46%로 높아졌다. 노인들이 막대한 현금을 장롱 속에 숨겨 놓은 채 소비에 나서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린 일본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작년 2분기 일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현금 ·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했다.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돈이 52%로 고위험 · 고수익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선진화한 사회보장 제도와 노후를 대비한 가계의 자산 운용 성향을 반영해 보험 · 연금 비중이 금융자산의 54.4%에 달했다.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나 사고로 돈이 필요할 때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사적연금,GDP의 4분의 1에도 못 미쳐
지난해 말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개인연금 158조원,퇴직연금 45조원 등 203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172조원)의 17.3%다. 2009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67.1%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9.8%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101.2%) 호주(82.3%) 핀란드(76.8%) 영국(73.0%) 미국(67.8%) 등 순이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40~50%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두 가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이 42%로 OECD 평균(68%)이나 미국(79%) 일본(6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돈이 퇴직 전 소득의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비금융자산 비율 80%
한국은 또 은퇴자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가계의 부동산 의존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은 79.6%였다. 미국(35.1%) 영국(54.8%) 일본(41.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5년 60.5%였던 금융자산 비중이 작년에는 65% 수준으로 높아졌다. 영국과 일본도 45~60%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소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구 고령화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점차 감소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는 이런 리스크를 한 몸에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도 현금 · 예금 편중
20%에 불과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도 그나마 대부분 현금과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자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다 보니 노부모나 자녀에게 '급전'이 들어갈 일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2%에서 지난해 2분기 46%로 높아졌다. 노인들이 막대한 현금을 장롱 속에 숨겨 놓은 채 소비에 나서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린 일본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작년 2분기 일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현금 ·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했다.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돈이 52%로 고위험 · 고수익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선진화한 사회보장 제도와 노후를 대비한 가계의 자산 운용 성향을 반영해 보험 · 연금 비중이 금융자산의 54.4%에 달했다.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나 사고로 돈이 필요할 때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