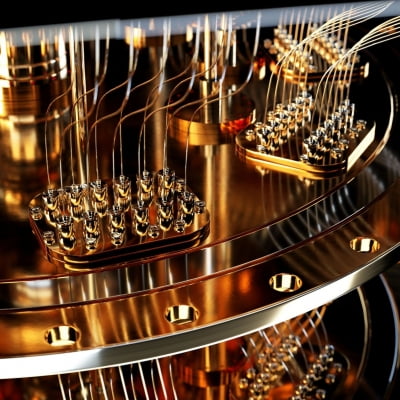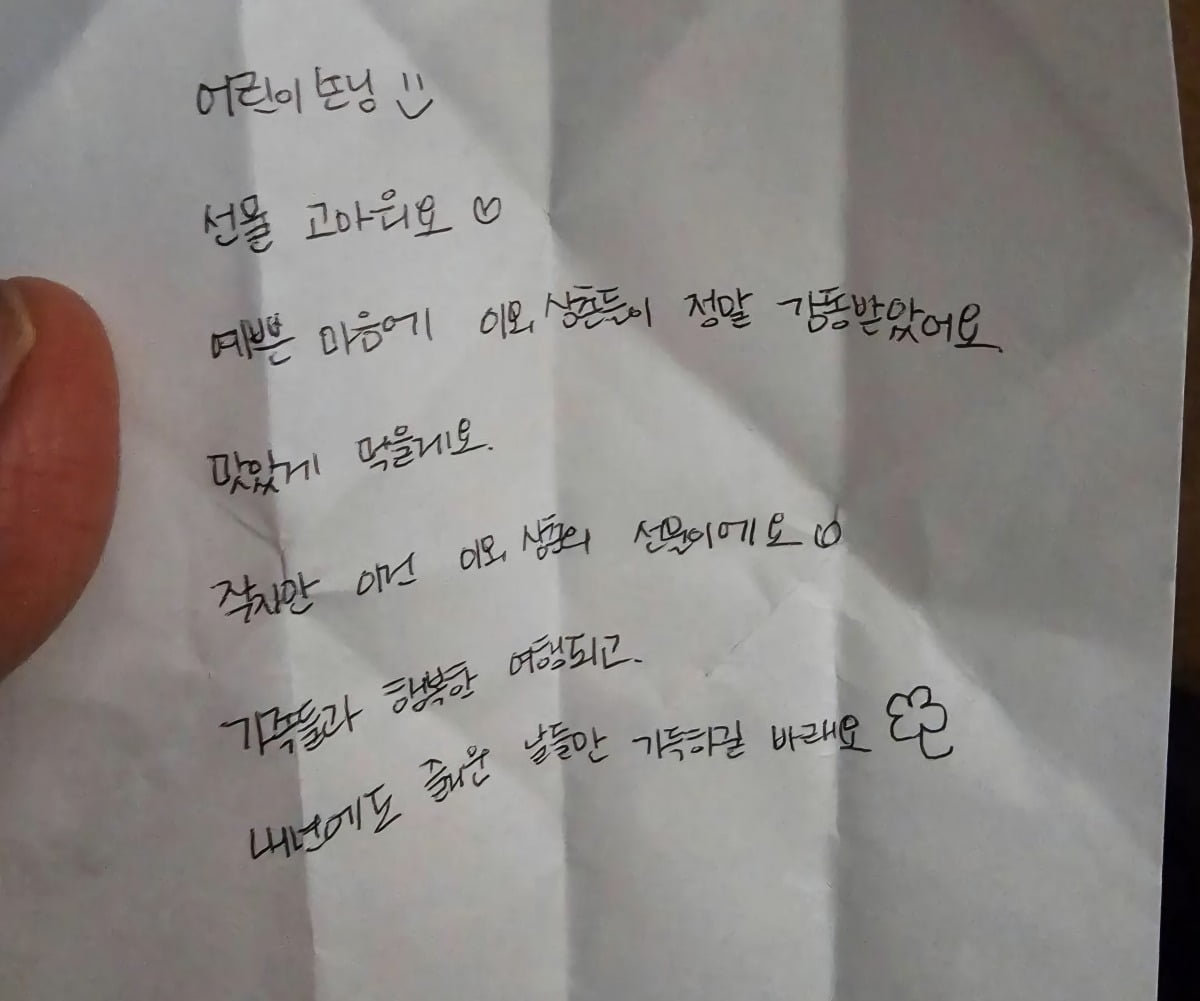정부가 만드는 TF가 소리만 요란할 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다. 책임과 권한부터가 불분명해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의제가 무엇이건 회의는 겉돌고 최종 결과물은 그저 정책의 참고사항 정도에 그치게 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TF를 꾸리겠다며 철학도 없이 이쪽저쪽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정부 조직과 공직자들의 생리를 모르는 탓에 관료들에게 휘둘려 들러리만 서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교수들로 채우는 것도 다를 게 없다. 총리실에서 만든 금융감독혁신 TF가 흐지부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TF를 만들면서 과제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모든 얘기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나갔던 것부터가 잘못이다. 금융감독개혁 TF에서 논의될 주제가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아니면 금감원 감독 문제인지 민관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열됐고 결국 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음부터 의사결정 절차를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릭 매스킨 교수 등이 주창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제도설계론)은 특히 절차의 규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고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위원회나 태스크포스를 만들 때는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의도를 숨긴 채 위원회를 만들어 들러리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한남동에 울린 '다시 만난 세계'…尹 체포 불발에 '초긴장'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0251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