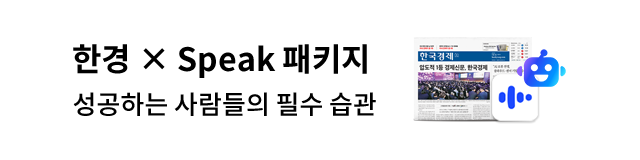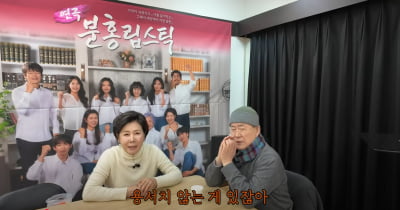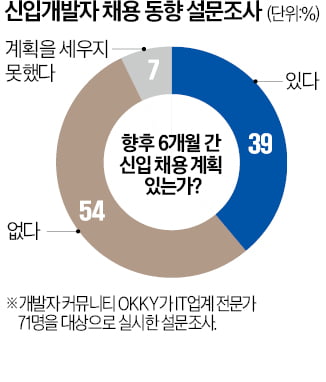'까도남(까칠한 도시 남자)'이 인기다. 까칠하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오히려 여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니….까칠함은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인간의 원시적 감성을 담당하는 변연계(limbic system)가 이성으로 통제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 의해 제어되지 않음을 뜻한다. 변연계가 있어 인간은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며 웃기도 하는 등 감성에너지를 표출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아무데서나 실실 웃으면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되기에 전전두엽이 이를 조절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사회적 통념에 맞게 감정을 재가공,절제해 표현하도록 교육받아왔고 이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다고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는 세상이 지나친 인공적 감정 조절에 대한 압박으로 감성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을 가족처럼' 같은 구호는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가족도 진심으로 아끼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번도 보지 않은 고객을 가족 같은 감성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세련되고 남을 배려하는 듯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에서 다소간의 이기적 까칠함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까칠함도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뇌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까칠한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친절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인공 감정 표현 스위치를 꺼보도록 하자.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느끼고 주인장의 불친절에서 자연미 넘치는 감성 에너지의 흐름을 즐겨보자.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며 방긋 웃는 여유를 가져보자.
윤대현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