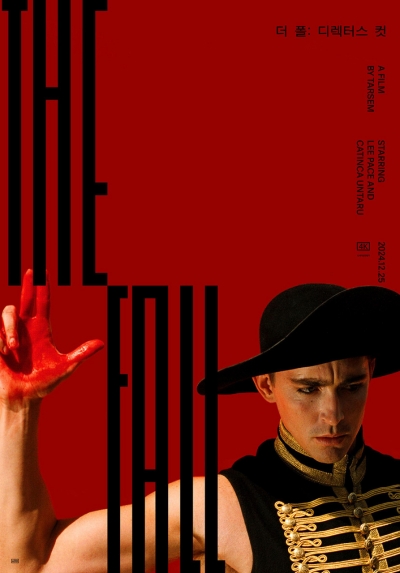[저자 인터뷰] 이덕일 "송시열에 맞선 윤휴…그는 자유로운 사상가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휴와 침묵의 제국' 펴낸 이덕일 씨
당시 주자학적 가치관과 충돌
신분철폐·북벌계획 수포로
당시 주자학적 가치관과 충돌
신분철폐·북벌계획 수포로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됐다. 한 사람은 '주자의 세상'을 구축하려 했다. 다른 한 사람은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안다는 말이냐"고 일갈했다. 함께 어울려 학문과 시사를 논했던 사이였다. 왜란에 이은 호란으로 흐트러진 사회를 추스르는 방법을 놓고 파열음이 빚어졌다. 주희를 절대화해 양반 사대부 계층의 기득권을 굳히려는 쪽과 생각의 자유,주체적 사회개혁을 꿈꾸는 쪽의 충돌이었다. 사문난적이란 모진 비난은 결국 피바람을 불렀다. 열 살 차이의 동년배,조선 중기의 우암 송시열(1607~1689)과 백호 윤휴(1617~1680) 이야기다.
우암과 백호,둘이 등을 돌리게 된 사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과연 윤휴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사약을 받아 마땅했을까. 《윤휴와 침묵의 제국》(다산초당,416쪽,1만7000원)은 그런 의문에 대한 역사학자 이덕일 씨(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50)의 답변이다. 이씨는 윤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냈다. 윤휴의 사회개혁과 북벌 주장이 실패로 돌아가고,사문난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기까지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주자가 절대적 가치로 군림하기 시작하던 시대였죠.윤휴가 죽은 뒤 조선은 침묵과 위선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런 침묵과 위선은 그의 사후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씨는 "윤휴는 사고의 다양성이 용납되지 않던 시대에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는 그런 윤휴에게 떳떳한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주인공 윤휴는 숙종의 요청으로 조정에 들어가 북벌정책과 사회개혁의 꿈을 펼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비운의 정치가이자 유학자다. 남인의 영수로 허목,윤선도 등과 함께 효종의 죽음을 둘러싼 1차 예송논쟁에선 자의대비에게 3년복을,현종 때의 2차 예송논쟁에선 1년복을 입힐 것을 주장하며 송시열의 서인 진영과 대립했다. '삼번의 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청을 치자는 북벌론도 밀어붙였다.
"북벌을 하자면 나라가 튼튼해야 한다는 게 윤휴의 생각이었어요. 신분마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 차고 다니는 호패법을 없애고 모두가 종이에 신분을 적어 다니는 지패법으로 신분차별을 없애려 했죠.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고 일반 백성에게는 병역을 완화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 주역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북벌을 얘기했던 서인들과는 달랐어요. "
무엇보다 윤휴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대와 충돌했다. 윤휴는 송시열이 세우려던 '주자학적 세상'의 대척점에 섰다. 《중용》 등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장구(章句)와 주(註)를 수정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주희의 눈으로만 경서를 보지 않았고,주희의 해석에만 매달리지 않았던 것.주희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의 말이나 글을 한 점,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고집한 송시열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대신을 역임한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는 경우는 역모밖에 없는데 윤휴의 사사 과정이 대역죄로 몰린 상황이네요. 그게 옳은 것인양 굳어졌습니다. 요즘 역사교과서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 북벌론자를 죽인 세력이 북벌을 주장한 것처럼 가르치죠.이런 풍토가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에까지 빌미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
그는 우리 역사학과 인문학 풍토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다양한 생각을 펼쳐보이고 토론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학계에는 정설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쪽이 심해요.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정설을 만들어 놓고는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면 인신공격까지 들어오죠.인문학과 역사학은 사실에 기초해야죠.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해석은 다퉈야 하는 게 '정설'이지 않나요?"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