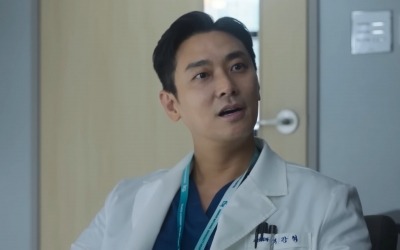[인사이드 Story] 현금 800억 쌓아둔 회사가 '관리종목 위기'라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성상인 '자린고비 경영'의 역설
삼정펄프, 하루 평균 거래량 642주…기준 미달
유화증권·샘표식품도 주가에 신경 안써 '곤욕'
삼정펄프, 하루 평균 거래량 642주…기준 미달
유화증권·샘표식품도 주가에 신경 안써 '곤욕'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정펄프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공시했다. 삼정펄프는 1974년 설립돼 2007년 상장됐다. 지난해 매출액 1417억원에 영업이익 106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791억원)이 시가총액(570억원)보다 많다. 잉여금(1020억원)을 자본금(64억원)으로 나눈 유보율은 1641.0%에 이른다.
이런 삼정펄프가 한계기업이나 떠안는 불명예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유동주식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마감 5거래일을 남겨 놓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거래량(10만주)에 1만584주가 모자랐다. 삼정펄프는 부랴부랴 대우증권과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삼정펄프의 사례는 증권가에서 '개성상인식 자린고비 경영의 역설'로 불린다. 거품 없이 한 우물만 파는 내실 경영으로 회사는 성장했지만 주가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증시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87세의 나이로 작고한 고 전재준 회장은 개성 출신으로 전형적인 개성상인식 짠물 경영을 해왔다. 생전 전 회장의 집무실은 다이얼로 작동하는 브라운관TV와 40년된 소파로 골동품점을 방불케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핍경영을 바탕으로 화장지를 만드는 원지 시장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삼정펄프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71.18%.신영자산운용과 경기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지분 16.77%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의 12.05%에 불과하다. 115억원의 순이익과 비교해 높지 않은 배당금(주당 800원)도 대부분 최대주주들에게 귀속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반기 하루평균 거래량은 642주에 불과했다.
개성 출신인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도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들어 윤 회장은 지난 21일까지 97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한 번에 20~40주씩 사들여 관심을 끌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윤 회장의 자사주 매입도 결국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화증권은 1980년대에 쓰던 철제 수납장을 아직도 사용하는 등 내핍경영으로 지난해 1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최대주주와 자사주 등을 제외한 유동주식 비율이 10% 남짓이라 하루 거래량이 30주에 불과한 날도 있다.
함흥 출신의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은 때아닌 경영권 분쟁에 빠지기도 했다. 지분 32.98%를 보유한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마르스1호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매년 표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2971%에 이르는 유보율을 지적하며 마르스1호 측이 배당과 주가 부양을 요구한다"며 "내실경영을 통해 쌓은 성과가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상인의 역설'은 1세대 경영자들이 퇴진하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작고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 전성오 삼정펄프 대표는 지난 2월 주당 0.25주씩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상장이후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적은 유통물량이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매년 무상증자를 지속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이런 삼정펄프가 한계기업이나 떠안는 불명예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유동주식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마감 5거래일을 남겨 놓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거래량(10만주)에 1만584주가 모자랐다. 삼정펄프는 부랴부랴 대우증권과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삼정펄프의 사례는 증권가에서 '개성상인식 자린고비 경영의 역설'로 불린다. 거품 없이 한 우물만 파는 내실 경영으로 회사는 성장했지만 주가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증시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87세의 나이로 작고한 고 전재준 회장은 개성 출신으로 전형적인 개성상인식 짠물 경영을 해왔다. 생전 전 회장의 집무실은 다이얼로 작동하는 브라운관TV와 40년된 소파로 골동품점을 방불케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핍경영을 바탕으로 화장지를 만드는 원지 시장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삼정펄프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71.18%.신영자산운용과 경기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지분 16.77%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의 12.05%에 불과하다. 115억원의 순이익과 비교해 높지 않은 배당금(주당 800원)도 대부분 최대주주들에게 귀속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반기 하루평균 거래량은 642주에 불과했다.
개성 출신인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도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들어 윤 회장은 지난 21일까지 97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한 번에 20~40주씩 사들여 관심을 끌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윤 회장의 자사주 매입도 결국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화증권은 1980년대에 쓰던 철제 수납장을 아직도 사용하는 등 내핍경영으로 지난해 1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최대주주와 자사주 등을 제외한 유동주식 비율이 10% 남짓이라 하루 거래량이 30주에 불과한 날도 있다.
함흥 출신의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은 때아닌 경영권 분쟁에 빠지기도 했다. 지분 32.98%를 보유한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마르스1호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매년 표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2971%에 이르는 유보율을 지적하며 마르스1호 측이 배당과 주가 부양을 요구한다"며 "내실경영을 통해 쌓은 성과가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상인의 역설'은 1세대 경영자들이 퇴진하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작고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 전성오 삼정펄프 대표는 지난 2월 주당 0.25주씩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상장이후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적은 유통물량이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매년 무상증자를 지속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9367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