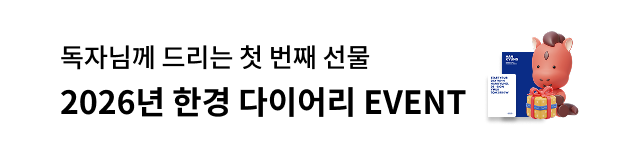특별한 형용적 표현인 이 '생태계적(ecosystemic)'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 생태계는 지구의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진화하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체계다. 식물과 동물,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군(生物群)들이 물 공기 토양 등 생물 아닌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생물군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을 얻고 환경변화에 적응해 공생하는 구조다. 생태계의 특성은 첫째,생물의 어떤 종(種)이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종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다. 둘째,그 네트워크 내에서 영양의 생산 소비 환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명체들의 '순환'이고,셋째,생태계 안의 어떤 구성 요소도 특별히 과잉을 빚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향해 저절로 움직여 가는 '역동적 균형'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진화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같은 자연적 공생과 조화,균형의 평화로운 생태계는 다름아닌 먹이사슬 내 약육강식에 의한 생물종 간 개체 수 조절과 함께 치열한 적자생존(適者生存) 투쟁의 결과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먹이사슬의 상하계층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먹이경쟁과 더 나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생식경쟁의 과정에서 같은 종끼리도 서로 살육하는 경우가 동물세계에서는 흔하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는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같은 생태적 지위에 있는 종들끼리도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은 더 강한 종으로 진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종만 살아남아 진화하고,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와 멸종의 과정을 밟는 것이 생태계 공생의 본질이자 움직일 수 없는 질서인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냉혹한 선택이다.
인간은 그들 사회만의 또다른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진화가 거듭되어왔다. 바로 시장(市場)이다.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생산과 소비,수요 공급의 원칙은 생태계가 먹이사슬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스템과 같다. 자연생태계의 변수가 환경이라면 시장의 변수는 소비자다. 시장에서 모든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이겨 시장에 잘 적응해야만 살아남고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지만 지는 순간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연생태계의 일부가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교란되면 생태계 전체의 순환과 균형이 흔들린다. 그 결과가 환경의 복수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시장의 본질이자 핵심가치인 경쟁을 저해하는 인위적 요소가 억지로 개입되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의 복수가 뒤따른다. 생태계든 시장이든 한번 파괴되면 평형(平衡)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이 "자연생태계처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로서의 겉모습일 뿐이다. 그 숲속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과 균형을 위해 지금도 살벌한 먹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진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진정 시장경제의 생태계적 발전을 의도하고 기대한다면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막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친서민이니 동반성장이니,또 공정사회론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공생발전의 구호는 필연적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해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