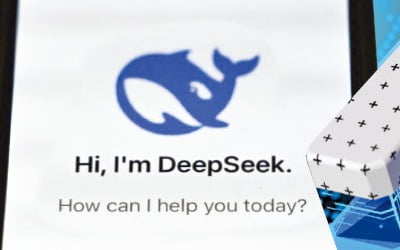한전 떠나는 '쌍칼' 김쌍수 "전기료 못 올려 소액주주에 미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프도 끊고 3년 열심히 했는데…"
기업생활 42년 소송 처음 당해…요금인상 못하면 더 큰 손실
기업생활 42년 소송 처음 당해…요금인상 못하면 더 큰 손실
김 사장의 별명은 '쌍칼'이다. LG전자 CEO 시절부터 칼날처럼 명확한 일처리를 좋아해 붙은 별명이다. 한전 사장으로 옮겨서도 '쌍칼'은 녹슬거나 무뎌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취임 초부터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혁신을 추구하라는 의미)','조직을 파괴하라','노 없는 도전'이란 혁신 논리를 펴며 공룡 기업 한전의 조직 수술에 착수했다. 취임 6개월 만에 본사 2340명의 정원 수를 줄이고,24처89팀이던 본사 조직을 21처70팀으로 슬림화했다.
그는 또 회사 전 직위에 대한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실시했다. 팀장급 이상 직원의 40%(438명)를 교체하고 보직 경쟁에서 탈락한 직원은 무보직 발령을 내는 등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도 접목시켰다.
하지만 그가 이끌어낸 혁신은 '3년 연속 적자'라는 부진한 실적에 빛을 잃었다. 연료비 상승과 낮은 전기요금으로 김 사장이 취임한 첫 해 한전은 3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과 작년 역시 각각 5687억원,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 사장은 퇴임식을 앞두고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경영을 흑자로 돌려놓지 못한 게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사장 취임 초부터 정부와 정치권를 상대로 설득했던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뤄내지 못해 한전 주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최근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이 2조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후임 사장 선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이 사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는 "42년 기업에 다니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개인 소송에 휘말린 건 처음"이라며 "피소를 당해 식물사장이 된 만큼 더 이상 사장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골프 한번 안 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게 됐다"며 개인적인 섭섭함도 토로했다.
한전의 적자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사장은 "한전은 엄연히 48%의 지분을 일반 주주가 갖고 있는 상장 회사"라며 "공기업이란 이유로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를 위해 한전의 실질적인 경영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물가를 잡겠다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압하면 결국 공기업 부실화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이뤄진 4.9%의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어렵다"며 "8~9% 인상돼야 그나마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푹 쉬며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항간에 돌았던 친정(LG고문) 복귀설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사장 퇴임으로 한전은 당분간 김우겸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작업은 늦어지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