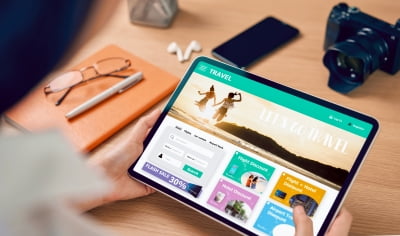관건은 보험료로 여겨지는 유료 연장 비용이다. 최근 르노삼성이 꺼내 든 보증 유료 연장비용은 기간에 따라 최저 38만원에서 최고 105만원이다. 적게는 1년,길게는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현대차도 차종에 따라 일반부품 또는 동력전달계통 보증 연장비용을 기간에 따라 달리 받고 있다. 그랜저 TG의 경우 보증기간 5년이 지나면 86만원의 비용으로 1년을 연장해 준다. 수입차로는 렉서스가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의 운행 상태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66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제조 또는 판매회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고정 고객이 확보되는 것이어서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료 보증 비용을 보면 얼핏 무상보증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 유료 보증 연장 기간은 대개 1년이다. '손해 보는 장사 없다'는 기업논리에 비추면 실제 자동차회사가 무상보증수리 비용으로 그만큼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무상 보증 기간도 결국 비용에 포함되고,연간 비용이 평균 60만원일 때 3년 무상이면 부담액은 180만원이 된다. 물론 무상 보증 기간 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보증비용은 고스란히 제조사의 이익으로 남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자동차회사에 보증수리는 일종의 복불복인 셈이다.
자동차회사가 무상 보증수리 기간 확대에 인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 아무리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도 보증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잠재적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무상 보증 기간 연장이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보증 수리'는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팽팽히 맞선 '외나무다리'가 아닐 수 없다.
흔히 고급차일수록 보증 수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간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미 가격 안에 늘어난 보증기간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마디로 유상(有償) 보증을 무상 형태로 제공받는 형태다.
자동차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은 제도적으로 '3년 또는 6만㎞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자동차회사는 해당 기간만 지키면 법적인 서비스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무상 보증 기간 확장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거세다.
특히 물 건너 왔다는 이유로 고가의 부품이 사용되는 수입차가 그렇다. 수입차를 사고 싶어도 유지비가 무섭다는 말이 근거 없는 푸념은 아니다. FTA로 유럽산 부품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국산차 대비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일 뿐 국산차 부품 값이 오른 것도 부담이다. 완성차 구입은 여러 차종의 비교 선택이 가능하지만 부품은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 비싸도,문제가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보증 수리 기간의 유료 연장도 좋지만 무상기간 연장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쉐보레가 쉐비케어라는 보증수리 확대정책 '3-5-7'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결국은 무상수리 기간 확대로 소비자 마음을 잡으려는 안간힘이었던 것이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