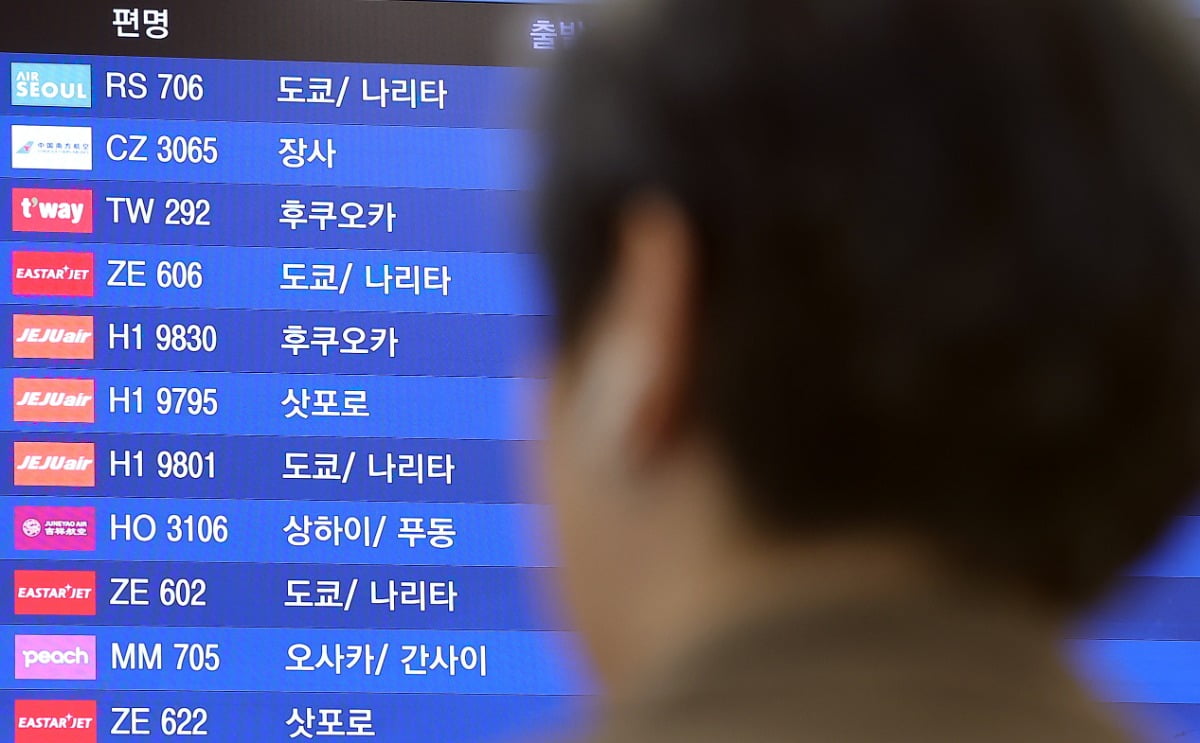[사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 공부하긴 했는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파수 경매제가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끝났다. 4세대 통신서비스 선점 차원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던 1.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는 결국 9950억원을 쓴 SK텔레콤에 낙찰됐다. 경매가가 1조원대를 넘기기 직전에 KT가 추가 입찰을 포기한 결과다. 하지만 승리한 SK텔레콤이나 실패한 KT 모두 불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경매제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경매제를 처음 도입하면서도 선진국에서조차 문제를 드러냈던 동시오름방식을 채택한 것부터 방통위의 어설픔이 그대로 드러난다. 참여업체 사이에서는 경매가가 1조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나왔지만 방통위만 부인했을 정도였다. 후속 주파수에 대한 경매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무조건 주파수를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후진적 행정도 과열을 부추겼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경매가가 비싸지면 사업자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경매가 여기서 끝난 것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열 후유증에 부담을 느낀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가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계속 경매제를 하겠다면 어떤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것인지 장기 로드맵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의 주파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엄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경매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매를 통해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돈을 더 거둬들이려고 꼼수를 썼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
경매제를 처음 도입하면서도 선진국에서조차 문제를 드러냈던 동시오름방식을 채택한 것부터 방통위의 어설픔이 그대로 드러난다. 참여업체 사이에서는 경매가가 1조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나왔지만 방통위만 부인했을 정도였다. 후속 주파수에 대한 경매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무조건 주파수를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후진적 행정도 과열을 부추겼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경매가가 비싸지면 사업자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경매가 여기서 끝난 것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열 후유증에 부담을 느낀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가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계속 경매제를 하겠다면 어떤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것인지 장기 로드맵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의 주파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엄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경매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매를 통해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돈을 더 거둬들이려고 꼼수를 썼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