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는 금융의 벤처…설립 문턱 대폭 낮춰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학회 '자본시장법' 심포지엄

정부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산운용업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과 개성,위험 감수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2일 한국금융학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및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는 금융의 벤처인데 정부가 벤처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대형사 위주로 된 설립 문턱을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인가 요건이 수탁액 1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운용액 5000억원 이상 자문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로 제한돼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은 소규모 헤지펀드가 아니라 대형 헤지펀드"라며 "1990년대 말 파산한 미국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도 덩치가 너무 커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보더라도 헤지펀드 설립 문턱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도 헤지펀드 규제를 푸는 대신 헤지펀드에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사(프라임브로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원기 PCA자산운용 대표는 "설립 후 2~3년 안에 70~80%가 문을 닫는 것이 헤지펀드의 속성"이라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필요악이고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헤지펀드 운용사가 자기 회사 헤지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은행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중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면서 기업금융 기능이 위축됐다"고 꼬집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역대 정부마다 동북아 금융허브,국제금융센터 등 금융 선진화 구호만 요란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불합리한 영업 관행,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숙고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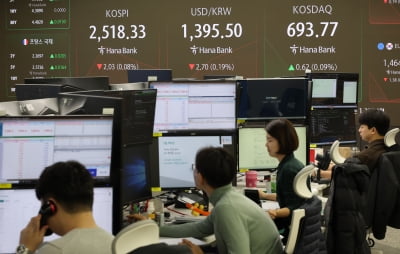
!["HBM 좋지만…" 증권가 'SK하이닉스 목표가' 낮추는 이유 [종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418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