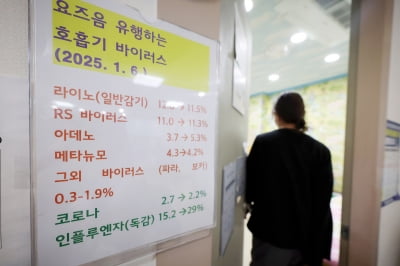여자는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이 말을 잃는다. 처음은 열일곱 살 겨울이었다. 그녀의 입술을 다시 달싹이게 한 것은 낯선 프랑스어 단어 '비블리오테크'.시간은 흘러 이혼을 하고,아홉 살 난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긴 후 다시 말을 잃어버린다. 모든 언어가 낱낱이 들리고 읽히는데,입술을 열어 소리를 낼 수 없는 차고 희박한 침묵의 고통.말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이미 저물어 '죽은 언어'가 된 희랍어다.
남자는 가족들을 모두 독일에 두고 십수년 만에 혼자 귀국해 희랍어를 가르친다. 그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아마 1~2년쯤은 더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아카데미 수강생 중 말을 하지도,웃지도 않는 여자를 지켜보지만 여자의 단단한 침묵과 마주할 뿐이다.
어느 날 건물 안에 들어온 새를 내보내려다 발을 헛디뎌 그의 안경이 깨진다. 위험에 빠진 그에게 여자가 두 손을 내민다.
지독한 침묵과 소멸해가는 빛.더듬더듬 소통에 나서던 두 사람은 마침내 빛도 소리도 없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 서로 교차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는 후반부에 합쳐져 절정을 이룬다. 절제된 단어와 문장은 시처럼 섬세하다. 소설은 빛과 어둠으로 완성되는 한 장의 흑백사진처럼 읽힌다.
문학평론가 이소연 씨는 "작가는 언어가 몸을 갖추기 이전에 존재하던 흔적,이미지,감촉,정념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신생의 언어와 사멸해가는 언어가 만나 몸을 비벼대는 찰나,우리는 아득한 기원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 동결해둔 인간의 아픔과 희열을 발견한다"고 평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300년 전 영국 목사가 만든 방정식을 AI가 써먹고 있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175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