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버핏이 제안한 것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 tax)를 올리자는 내용이었다. 자신은 15%의 자본이득세를 내는데, 직원들은 30%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 이런 버핏세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변질됐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 내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지금도 소득세를 많이 낸다. 표에서 보듯 2009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에 속하는 사업소득자는 13만1400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4.70%에 달하지만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2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1.34%, 10억원 초과는 0.08%밖에 안되지만 각각 종합소득세수의 66.8%와 19.80%를 책임진다. 납세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5.5%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반면 전체 소득자의 21.8%에 해당하는 77만8500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근로소득세도 상황이 비슷하다. 근로소득자의 12%가 세금의 84.7%를 낸다.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40%에 이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지니계수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에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율과 세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세율이 정점을 지난 단계라는 얘기가 된다. 세율을 높여봐야 세수가 늘지않는다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나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율은 너무 낮다.
우리는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세수를 늘린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실제 소득세 통계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된다.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8.8%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4.9%나 증가했다. 2009년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포인트 낮춘 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스웨덴 등이 진작에 상속세 부유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한 것도 이런 감세효과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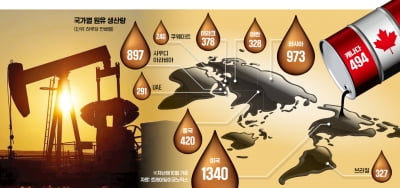


![[속보]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3.180238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