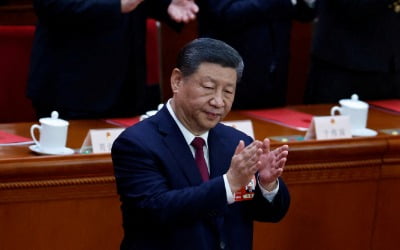절박한 해운사들, 정책금융기관에 'SOS'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 상환조건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A해운사 대표)
“우회적으로 지분을 출자해서라도 돈을 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B해운사 대표)
고유가와 운임가격 하락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업계가 정책금융기관들에잇달아 ‘SOS(구조신호)’를 치고 있다. 그간 해운업체들의 ‘돈줄’ 노릇을 했던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대출 만기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2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해운업계 사장단 간담회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해운업체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다. 일부 해운사 대표들은 수출입은행에 지분 출자 형태로 투자해 달라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STX팬오션 부회장),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 황규호 SK해운 사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출입銀,“선박 담보인정비율 80%로 상향”
해운업체들은 수출입은행에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 가지 제시했다. 한 해운사 대표는 “조선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에도 수출금융 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해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의 “OK” 사인을 받아냈다. 김 행장은 선박 담보인정 비율도 종전 70%에서 앞으로 80%까지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을 균등분할해서 갚아야 해 부담스럽다는 원성도 쏟아졌다. 김 행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수출입은행은 모두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만 대출할 수 있다”며 국내 민간은행들과 협조해서 원금 거치 비중을 높이는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을 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수출입은행이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할 때 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대는 것을 선박금융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김 행장은 이와 관련해 “나중에 이자 탕감 등 경영개선작업을 할 바에는 지분을 투자해서 호황기에 배당금을 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무역보험 5000억 추가보증 요청”
해운업체들은 그간 전체 자금의 80% 가량을 DnB노르, BNP파리바, CA-CIB, ING은행 등 유럽계 금융회사들에서 조달했다. 당시엔 이들이 수출입은행보다도 싸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내 코가 석자’가 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물론, 국내 민간은행들도 침체기의 해운사에 돈 대 주기를 꺼리고 있다. 기댈 곳은 정책금융 기관들밖에 없는 이유다.
해운업계가 정책금융 기관을 찾아가 SOS 요청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조만간 무역보험공사와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에는 선박금융 보증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해운업계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선박 36척을 사달라고 정부에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선박 매입을 요청한 해운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10개다. 캠코는 현재 5000억원의 선박펀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해운사 얼마나 어렵기에…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1~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올 들어 총 500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현대상선과 STX팬오션 등 다른 대형 선사들도 3분기 각각 981억원과 51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고유가와 운임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해운사 선박 운항원가의 25~3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 벙커C유 가격은 이달 들어 3년 만에 t당 70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평균인 465달러를 4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선박은 너무 많이 공급되고, 경기침체로 수요는 줄어들어 운임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 등 글로벌 대형 선사들까지 나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만 대한해운,삼호해운,양해해운,조성해운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황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면서 추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소 해운회사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상은/장창민 기자 selee@hankyung.com
“우회적으로 지분을 출자해서라도 돈을 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B해운사 대표)
고유가와 운임가격 하락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업계가 정책금융기관들에잇달아 ‘SOS(구조신호)’를 치고 있다. 그간 해운업체들의 ‘돈줄’ 노릇을 했던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대출 만기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2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해운업계 사장단 간담회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해운업체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다. 일부 해운사 대표들은 수출입은행에 지분 출자 형태로 투자해 달라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STX팬오션 부회장),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 황규호 SK해운 사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출입銀,“선박 담보인정비율 80%로 상향”
해운업체들은 수출입은행에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 가지 제시했다. 한 해운사 대표는 “조선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에도 수출금융 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해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의 “OK” 사인을 받아냈다. 김 행장은 선박 담보인정 비율도 종전 70%에서 앞으로 80%까지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을 균등분할해서 갚아야 해 부담스럽다는 원성도 쏟아졌다. 김 행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수출입은행은 모두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만 대출할 수 있다”며 국내 민간은행들과 협조해서 원금 거치 비중을 높이는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을 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수출입은행이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할 때 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대는 것을 선박금융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김 행장은 이와 관련해 “나중에 이자 탕감 등 경영개선작업을 할 바에는 지분을 투자해서 호황기에 배당금을 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무역보험 5000억 추가보증 요청”
해운업체들은 그간 전체 자금의 80% 가량을 DnB노르, BNP파리바, CA-CIB, ING은행 등 유럽계 금융회사들에서 조달했다. 당시엔 이들이 수출입은행보다도 싸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내 코가 석자’가 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물론, 국내 민간은행들도 침체기의 해운사에 돈 대 주기를 꺼리고 있다. 기댈 곳은 정책금융 기관들밖에 없는 이유다.
해운업계가 정책금융 기관을 찾아가 SOS 요청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조만간 무역보험공사와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에는 선박금융 보증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해운업계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선박 36척을 사달라고 정부에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선박 매입을 요청한 해운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10개다. 캠코는 현재 5000억원의 선박펀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해운사 얼마나 어렵기에…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1~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올 들어 총 500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현대상선과 STX팬오션 등 다른 대형 선사들도 3분기 각각 981억원과 51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고유가와 운임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해운사 선박 운항원가의 25~3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 벙커C유 가격은 이달 들어 3년 만에 t당 70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평균인 465달러를 4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선박은 너무 많이 공급되고, 경기침체로 수요는 줄어들어 운임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 등 글로벌 대형 선사들까지 나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만 대한해운,삼호해운,양해해운,조성해운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황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면서 추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소 해운회사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상은/장창민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