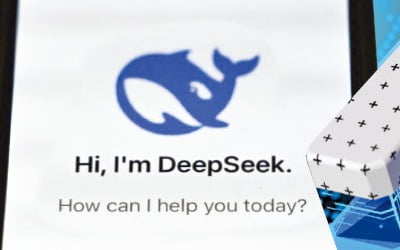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박성희 칼럼] 하얀 라면과 저가 TV 돌풍 이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성적 스토리가 고정관념 타파…뉴노멀 시대, 합리적 소비가 대세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박성희 칼럼] 하얀 라면과 저가 TV 돌풍 이후](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20562601&indate=20111205&photoid=201112057287&size=1)
꼬꼬면과 나가사키짬뽕, 기스면 등 하얀 국물 라면이 라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지난달 출고한 꼬꼬면은 2000만개. 그래도 모자란다는 판이다. 삼양식품 ‘나가사끼 짬뽕’도 마찬가지. 이마트 11월 매출에서 농심 신라면을 제쳤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5개짜리 번들’만 비교한 것으로 전체 매출과는 차이가 있다지만 돌풍인 건 틀림없다. 오뚜기 기스면도 출시 20일 만에 600만개 이상 팔렸다고 한다. 25년간 1위를 내준 적이 없다던 신라면 아성이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수출 계약도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하얀 라면 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익숙한 것에 대한 반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참 등. 꼬꼬면의 경우 개그맨 이경규 씨가 방송 중 선보인 라면의 상품화란 스토리에 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착한’ 선포가 한 몫 했다는 시각도 있다.
어쩌면 비싼 값에 내놨다 과장 광고 판정을 받은 신라면 블랙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을 수도 있다. 제품의 성패는 단순한 품질이 아니라 제품에 얽힌 스토리와 기업 이미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까닭이다. 꼬꼬면이 하얀 라면의 효시도 아니다. 오래 전에 이미 하얗고 구수한 사리곰탕면이 나와 있었다. 하얀 라면에 대한 수요는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말이다.
고객의 선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었는데도 승자 쪽에선 눈치채지 못했거나 일시적 유행이라고 여겼던 것을 경쟁업체에서 스토리화함으로써 라면은 빨간 것이란 고정관념이 깨졌는지 모른다.
물론 유행과 흐름의 구분은 어렵다. 이마트의 49만9000원짜리 저가 발광다이오드(LED) TV 판매 바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그 때문이다. USB 장착이 불가능한 굿이너프 제품의 인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옥션에서 국내산에 USB 2.0 단자도 있는 ‘LED 32’형 풀HD 모델’ 2011대를 더 싼 값에 내놓겠다는 걸 보면 지나가는 일로 치부하긴 어려울 성싶다. 안 그래도 올해 국내시장에선 싸고 괜찮은 상품을 찾는 합리적 소비 추세가 확산됐다고들 한다.
저가상품 붐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여러 가지다. 유통 대 제조의 주도권 싸움 격화로 시장 자체가 레몬마켓이 될지 모른다, 50년 동안 하이엔드 시장을 개척해온 기업들이 당황할 것이다, 저성장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뉴 노멀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인 만큼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등.
농심이 잃어버린 시장을 어떻게 되찾고, 저가 TV 공세에 가전업체가 어떤식으로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건 고정관념 혹은 불변의 기정사실로 여겨져온 어떤 것도 깨지고, 한번 무너지면 걷잡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이 비싸고 복잡한 제품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던 기존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헤어지자는 선언은 서서히 식은 사랑의 결과다. 무심해서 감지하지 못했을 뿐. 시장의 변화 또한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고객이 떠난 뒤에 당황하고 후회하기보다 미리 들여다보고 챙기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지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모셔노믹스’의 저자 댄 힐의 말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몫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고 품질 차별화가 이뤄지기 힘든 시대에 남은 건 신뢰뿐이다. 신뢰는 이성보다 감정에서 비롯된다. 고객과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자면 감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은 뒤 이성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떠나는 건 상품이 아니라 회사 탓이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