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대만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자 중국은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쐈다. 리덩후이 당시 총통은 미국에 항공모함 파견을 요청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고 선거에선 압승을 거뒀다. 리덩후이가 초강수로 맞선 데는 까닭이 있었다. 중국이 쏜 미사일이 공포탄이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만 첩보원이 중국군 고위층을 매수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중국이 허풍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다.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를 휴민트(HUMINT)라고 한다. 휴먼(human)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합성어다. 위성, 전파분석장치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수집하는 정보인 시진트(SIGINT· signal intelligence)와 함께 정보수집의 두 축을 이룬다. 과학기술 발달로 시진트가 중시되는 추세지만 상대의 내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민트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단이다.
우리 정보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감지하지 못했던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사망 후 50시간이 넘도록 까맣게 몰랐다는 건 휴민트 부실이 도를 넘은 증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 위원장이 탔던 열차가 움직였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때 국정원과 군이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교류 확대에 따라 대인 정보수집 라인을 축소한 게 원인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정책기조가 바뀌었으나 휴민트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첩보망 구축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은 주로 탈북자나 중국 국경지대의 북한인, 조선족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세기 첩보전의 역사’의 저자 어니스트 볼크먼은 ‘첩보는 공인된 반칙’이라면서 세계사의 주요 고비마다 큰 힘을 발휘했다고 썼다. 우리는 유례없이 폐쇄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상대와 대치해 있다. 어차피 첩보전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독하게 해야하는 이유다. 매년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국정원은 동네 정보원’이란 비아냥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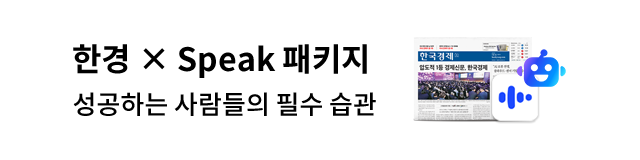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한경에세이] 정치인의 듣기평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705237.3.jpg)
![[시론] AI는 늦었지만 AX는 앞서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9588375.3.jpg)
![[천자칼럼] 보이콧 시달리는 테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0295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