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대선 탄력붙은 박근혜 … 수도권 패배는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기의 당 맡아 고군분투…與 승리 일궈내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 선거’였다. 그는 지난해 말 벼랑 끝에 몰린 당을 떠맡아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선 이후 혼자서 이번 총선을 위한 기획과 연출을 주도했다. 선거 결과가 박 위원장의 중간 평가로 직결되는 것도 그래서다.
올초만 해도 당내에는 ‘100석도 건지기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으나 공천과 선거운동 등을 거치며 박 위원장의 리더십이 견고해지고 당 지지율이 서서히 반등하면서 당내 여론은 ‘역시 박근혜다’ ‘해볼 만하다’로 돌아섰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승패 기준과 상관없이 박 위원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박 위원장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이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역시 박근혜’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남과 강원, 충청에선 박풍(박근혜 바람)이 거셌다. 충청, 강원 지역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건졌다. 수도권 패배에도 야당과 1당 경쟁을 벌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수도권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잡지 못하면 사실상 대선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의 고전은 두고두고 박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야권의 공세가 거셌던 부산에서 고전한 것도 그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패배에 따른 당내 비판론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선 후보 경쟁 구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을 당내 후보 경쟁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민자당이 참패하자 민정계는 ‘YS책임론’을 제기했고, 김영삼 당시 대표 최고위원은 청와대를 찾아가 ‘정권책임론’으로 역공을 가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날 출구조사 방송 시간에 맞춰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 도착한 박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언급 없이 1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이번 총선은 박 위원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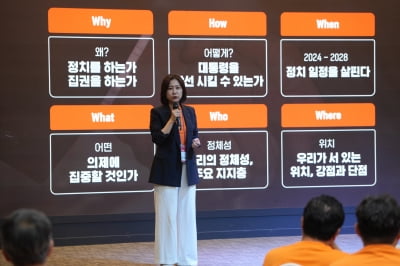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