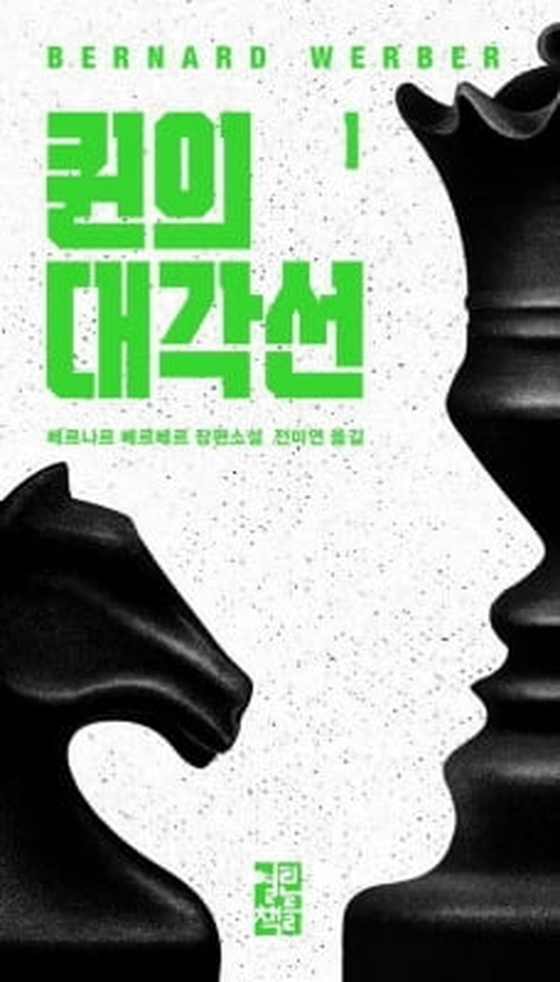[시론] 해양플랜트산업 '투 트랙' 전략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합설계등 핵심기술 수입 의존
대·중기 역할분담 경쟁력 키워야
안충승 < 한국해양대 석좌교수·해양공학 >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중심이 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GS건설, 현대건설, 포항제철 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군 28개사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해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40여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됐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경쟁으로 보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이 현명하게 동반성장의 길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양플랜트는 국내 대형 조선해양 3사(현대, 삼성, 대우)가 시추선과 대형 FPSO(부유식 기름 생산·저장·하역 설비)를 제작해 수출도 많이 했다. 하지만 정작 종합설계 기술은 외국 전문회사에 의존하고 핵심기자재는 거의 수입하다 보니, 국산화율이 20% 이하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작 이후 운송, 설치, 운용, 서비스분야도 거의 외국회사의 몫이었다.
이런 상항에서 우리가 5년 이내에 최대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하고 외국 기름회사로부터 평판이 좋은 외국 전문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한다.
대기업이 경쟁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기자재 개발과 중소형 FPSO 개발에 필요한 초기 원천기술로 먹거리 창출을 하려면 외국기업들의 기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중소기업엔 큰 부담이 돼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
외국에서도 핵심 기자재의 다양성이나 세심한 전문성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제작 면에서 대기업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 해양플랜트를 제작 설치하는 대기업들도 모두 그 핵심 기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번 해양대 컨소시엄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만으로는 5년 내에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먹거리 창출을 실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국의 10여개 유명 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해양플랜트 전문업체들과 기술협조 양해각서를 맺어 놓았다.
반면에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힘든 해저해상종합설계 분야와 고가의 해양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설치분야는 대기업군이 나서야 할 것이다. 외국 전문회사를 인수·합병(M&A)해서 5년 내에 일도 익숙해지고 먹거리도 창출(기름회사로부터 직접 수주받는 일)하려면, 이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군은 그럴 만한 실력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군이 뭉친 컨소시엄에서는 외국 회사를 M&A해 세계적인 설계회사와 설치회사를 만들어 먹거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고, 해상 및 해저 기자재 분야는 중소기업군에 맡겨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의 길로 가는 방향이고,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제 대기업은 기자재 분야보다는 EPC(설계·구매·제작·운송·설치) 계약을 통해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한국 대기업들의 강점이며 저력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추선의 70%를 제작하고 있는 3대 조선소가 힘을 합쳐 시추운용회사까지 만들면(시추선 용선료 1일당 60만달러) 앞으로 엄청난 국부 창출은 물론 해외자원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투 트랙’ 전략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해양플랜트를 육성한다면 5년 내에 50조원의 매출과 1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해양대 컨소시엄의 연구보고서이다.
안충승 < 한국해양대 석좌교수·해양공학 >
daniel.csahn@partner.sams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경영자의 삶은 책임이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881997.3.jpg)
![[기고] 초여름 실종사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162090.3.jpg)
![[한경에세이] 대학+실버타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