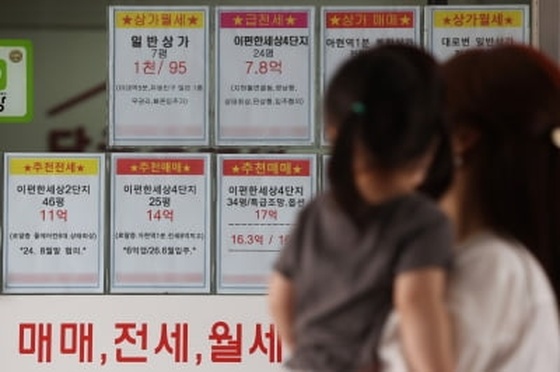대기업 그룹 장악력 더 커졌다…계열사 지분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의 그룹 장악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지난해(28.6%)보다 2.8%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전년(54.2%)보다 1.9%p 늘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중 대기업 총수와 친족, 임원 및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4.47%)보다 0.3%p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9.55%로 2.19%p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았지만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룹 장악력을 강화한 것이다.
내부지분율이 상승한 이유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기존 집단들보다 높고,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이 물적분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로 연속 지정 집단(38개,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삼성전자는 LCD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했고, GS는 에너지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GS에너지를 세웠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환상형출자(순환출자) 구조도 여전했다. 순환출자는 계열회사간 출자구조 중 하나로 출자 연결고리가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지만 모두 총수 있는 집단이었다. 금호아시아나와 웅진, 태광은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한화에는 새로운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올해 신규지정된 한라에도 순환출자가 존재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는 단핵구조(1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출자고리가 연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다핵구조(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 또는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였다.
한편 총수가 있는 집단 29개가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18개), 한국투자금융(14개), 삼성(11개), 롯데·동부(각 10개) 순이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삼성(16건), 동양(6건), 미래에셋(5건), 현대·교보생명보험(각 4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최근 5년간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상승했다" 면서 "이는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