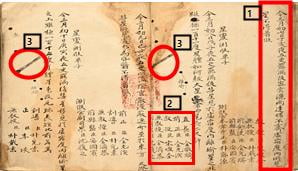[시론] 대학기득권 깨 교수창업 활성화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벤처창업 때 교수지분 인정 안 해…의욕저하에 투자자 유치도 한계
외국 지재권평가 추세 본받아야
이제호 < 성균관대 정보통신학부 석좌교수 jeholee@gmail.com >
외국 지재권평가 추세 본받아야
이제호 < 성균관대 정보통신학부 석좌교수 jeholee@gmail.com >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사학 명문인 모 대학이 지금까지 배출한 교수 창업 숫자가 단지 7개란 말을 듣고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대학 당국이 교수나 학생들이 창업하거나 그들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상하이에 있는 한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교수들이 자신이 평생 연구한 것을 갖고 벤처회사를 만들어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국가적 위기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감명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벤처바람이 불면서 각 대학에서 창업지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탓이다. 명성이 자자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도 거기서 나오는 혁신형 벤처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다.
최근 서울에 있는 사립 명문대에서 근무하는 중견교수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결과를 외국의 유명 학술잡지에 게재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학내 규정대로 대학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돼 있음은 물론이다. 마침 정부가 교수들의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산업화로 잇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교수도 응모해 우수 과제로 평가돼 그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겼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초기 연구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이 연대해 벤처회사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업을 주도할 교수에게 단 한 주의 주식도 배정을 못하겠다는 대학의 태도였다. 즉 연구의 결과물인 특허권리는 대학에서 소유하고 그 절반은 교수의 몫이라면서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려 할 때 교수는 기술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나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새로 창업될 벤처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교수는 지분 하나 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벤처회사의 연구·개발과 경영리스크만 떠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구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지분이 없는 창업교수의 동기 부여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벤처의 속성상 끊임없이 후속투자가 필요할 터인데 어느 투자자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창업자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대학 지주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대학에서 교수에게 지분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며, 필요하면 투자금을 별도로 내고 지분을 사가라는 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식소유권이 현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벤처회사의 기반이 되는 지식소유권 역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기술 투자지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대학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특허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사용이나 경비 지출 등을 인정받아 5~20%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창업교수와 투자자, 임직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최근 한 대학에서 벤처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바 있는 최고경영자 출신을 교수로 영입해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지원 활동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매우 신선하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에서는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이 그 역할을 다하고 사회의 활력이 소진될 때면 언제나 대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나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상아탑에만 안주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제도적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다.
이제호 < 성균관대 정보통신학부 석좌교수 jeholee@gmail.com >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벤처바람이 불면서 각 대학에서 창업지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탓이다. 명성이 자자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도 거기서 나오는 혁신형 벤처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다.
최근 서울에 있는 사립 명문대에서 근무하는 중견교수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결과를 외국의 유명 학술잡지에 게재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학내 규정대로 대학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돼 있음은 물론이다. 마침 정부가 교수들의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산업화로 잇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교수도 응모해 우수 과제로 평가돼 그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겼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초기 연구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이 연대해 벤처회사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업을 주도할 교수에게 단 한 주의 주식도 배정을 못하겠다는 대학의 태도였다. 즉 연구의 결과물인 특허권리는 대학에서 소유하고 그 절반은 교수의 몫이라면서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려 할 때 교수는 기술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나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새로 창업될 벤처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교수는 지분 하나 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벤처회사의 연구·개발과 경영리스크만 떠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분구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지분이 없는 창업교수의 동기 부여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벤처의 속성상 끊임없이 후속투자가 필요할 터인데 어느 투자자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창업자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대학 지주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대학에서 교수에게 지분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며, 필요하면 투자금을 별도로 내고 지분을 사가라는 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식소유권이 현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벤처회사의 기반이 되는 지식소유권 역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기술 투자지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대학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특허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사용이나 경비 지출 등을 인정받아 5~20%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창업교수와 투자자, 임직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최근 한 대학에서 벤처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바 있는 최고경영자 출신을 교수로 영입해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지원 활동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매우 신선하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에서는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이 그 역할을 다하고 사회의 활력이 소진될 때면 언제나 대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나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상아탑에만 안주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제도적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다.
이제호 < 성균관대 정보통신학부 석좌교수 jeholee@gmail.com >